
'뿌리깊은 나무'에서 펴낸 '혼자 사는 외톨박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사라져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인터뷰한 글들이었는데,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었다. 오랜만에 그런 글을 읽었다. '해뜨는 검은땅'이라는 시집을 내기도 한 박영희의 르포집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책이다. 이미 작가는 '길에서 만난 세상' '아파서 우는 게 아닙니다' 같은 책을 낸 적이 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삶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담담하게 기록한다. 작가의 감정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 때문일까, 자칫 어둡거나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 내용을 읽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재개발지역 주민, 붕어빵을 파는 아주머니, 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아저씨, 공부보다는 알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학생, 아파트 경비원, 사기를 당해 자기도 모르게 빚쟁이가 돼버린 노숙자, 사장이 시키는 건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돼버린 아줌마 등이다. 이 책을 읽으며 이들이 바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재개발지역 주민 김 노인은 사막이나 다름없는 중동 건설현장에 나가 꼬박 다섯 해를 일해 집을 장만했다. 그는 어렵사리 장만한 집을 재개발로 잃을까 두려워하며 주민 90%가 이주해간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이후 주어진다는 아파트가 전체 주민 중에서 20%만 입주 가능하고, 그마저도 추가 부담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김 노인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최하 2억원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노인의 소원은 한평생 살아오며 자식들을 결혼시킨 집에서 남은 생을 살다 그 집에서 눈감는 것이다.
지금도 단속반에게 쫓기는 꿈을 꾼다는 떡볶이 아주머니 김영엽 씨의 양볼은 20년 넘게 길에서 붕어빵을 구워내는 동안 동상에 걸려 새빨갛다. 특히 그에게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남아 있다. 나라 이름을 내건 잔치가 있는 해이면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아예 장사를 접어야 했기 때문이다. 단속반에게 쫓길 걱정 없이 떡볶이 장사를 하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골목 쓰레기를 모으고 치우는 청소부 윤유복 씨는 총도 무섭고 차도 무섭지만 쓰레기가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헤드라이트 불빛을 쏘며 새벽 거리를 질주하는 차량들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청소하는 그는 썩은 냄새 때문에 가족들도 떠나는 직업이지만, 정년이 되면 그마저도 못할까 두렵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전북대 미대 이진희 씨는 몸도 고되지만, 수업을 마치기 바쁘게 알바 현장으로 달려가는 터라 친구들을 사귈 시간이 없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말한다. 알바가 끝나면 학교 작업실에서 밤샘을 하기 일쑤라는 그.
아파트 경비원 정 씨는 택배 물건을 안방까지 배달해 달라는 주민은 대개 30'40대의 젊은 사람들이라며,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잘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했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0.5평 경비실 안에서 공휴일과 무관한 삶을 살며 24시간 맞교대로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 역시 우리 주변에 있으되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 온 사람들이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부품을 생산하는 S기업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해 온 정춘화 씨는 어느 날 갑자기 휴직하라는 강요를 받고 사장과 회사에 대한 배신감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 회사에서 오후 8시까지의 잔업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고, 자정까지 업무가 계속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90%는 40'50대의 여성들이다. 이렇듯 이 책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용학도서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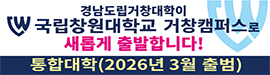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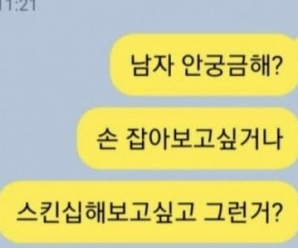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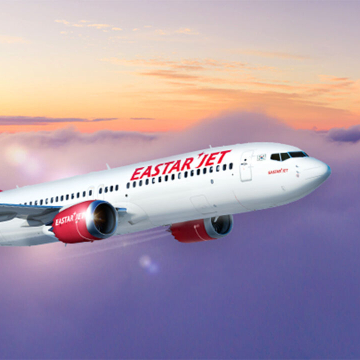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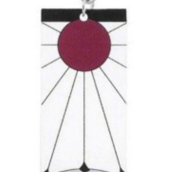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