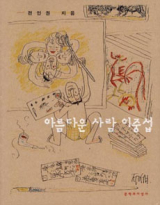
화가 이중섭 하면 '소'가 떠오른다. 화면을 가득 채운, 굵고 강렬한 색상과 터치. 석양을 배경으로 콧김을 내뿜으며 무엇인가 말이라도 하고 싶은 것 같은 표정의 소. 화가 이중섭(1916~1956)은 신화 속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불과 40세의 나이로 요절한 천재화가이자 비극적 예술가의 표본이기도 하다. 박정희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정치학자이면서 미술평론가로도 활동한 전인권은 '아름다운 사람 이중섭'에서 신화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는 이중섭 예술에서 소가 지니는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이중섭 예술에서 소는 거룩한 존재다. 이중섭은 소를 보되 밭을 가는 소를 본 것이 아니라, 소가 지닌 영성을 보며 소를 신앙심으로 대했다. 고은은 이중섭 예술을 가리켜 '소의 종교'라고 불렀다. 나는 소를 이중섭 예술의 토템이라고 부르고 싶다. 또한 이중섭에게 있어 소는 자기 자신이며 동시에 신앙 대상이었다. 소와 이중섭의 이 같은 관계는 원시 부족과 그 부족이 섬기는 토템의 관계와 유사하다. 그만큼 이중섭의 미의식은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구석이 있다."
이중섭은 '한국의 소를 그려야 한다'는 자의식이 매우 강했다고 한다. 이중섭의 소는 본연의 모습으로 오로지 한 마리로만 존재해야 하는 절대성과 유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중섭의 소 그림은 그 속에 어머니의 이미지를 내포한다. 소 그림은 무의식 차원에서 어머니와 결합된 이중섭의 자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 그림은 이중섭의 자화상이기도 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이중섭은 어린아이의 화가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그는 소보다 더 많은 어린아이를 그렸다. 담배종이에 그린 은지화의 상당 부분도 군동화이다. 군동화에는 절대적 의미가 없으며 모든 것이 어울려 있다. '서로가 서로를 즐겁게 하는 공희(共戱)의 세계요, 친교의 동작이 강조되는 상대의 세계'다.
저자는 이중섭의 예술이 두 가지 경향을 갖는다고 본다. 첫째는 소박한 주술이요, 둘째는 장엄한 제사와 관련이 있는 벽화 지향이다. 소박한 형태의 주술적 염원은 이중섭 예술의 밑바닥에 흐르는 중요한 경향이다. 그의 예술이 벽화를 지향한다는 것과 벽화가 지니고 있는 주술적 목적은 이중섭 예술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하려는 화가가 아니라 순수의 극단을 얻으려는 화공이었으며, 예술가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켜내려 했던 순교자였다. 그의 예술이 한편에서는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의 소박한 기원, 어린애 같은 열망을 담은 주술의 형태를 띠며, 다른 한편에선 소 그림이나 벽화의 추구에서 보는 것처럼 장엄한 제의의 형식을 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중섭 예술의 이런 전개 방식은 일점일획까지 한국적인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따르는 한국적인, 너무도 한국적인 것이었다."
이중섭은 소 그림과 군동화를 통해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통해 파괴된 민족의 정체성을 복원해내었다. 또한 그의 예술에는 시대의 아픔이 들어 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시대의 희생물이었다.
평안남도 평원군 송천리에서 태어나고 평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이중섭의 예술은 고구려 고분 벽화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의 예술은 선묘 위주의 북방 기질을 보여 준다. 잠깐의 이별인 줄 알고 월남하여 실향민이 된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일본인 아내 마사코와 두 아들과도 전쟁 중 헤어져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극한의 가난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다가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했다.
저자는 이중섭에게서 신화적 베일을 걷어내고 그의 예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이중섭이야말로 뼛속까지 한국적이며 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거의 유일한 국민 화가라고 말한다.
신남희(수성구립 용학도서관 관장)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