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리 맞은 단풍이 이월 봄꽃보다 붉구나'(霜葉紅於二月花). 가을을 노래한 낭만시의 절창으로 꼽히는 두보의 '산행'(山行) 시다. 가을 한 철 전국을 한바탕 소동으로 몰아넣는 단풍의 시효는 고작 20일. 10월 하순 설악산을 물들인 단풍은 하루 25㎞씩 남하해 11월이면 섬진강변을 곱게 채색한다.
'일장추몽'(一場秋夢), 낙엽의 향연은 짧은 기간만큼 아쉬움도 크다. 지난주 강원도를 출발한 단풍은 하루에 고도를 50m씩 낮춰가며 남진해 오더니 어느새 추풍령을 넘어 남도 산자락에 천연색 물감을 풀어놓았다. 가을 진객, 계절의 전령사 단풍을 찾아 무주로 떠나보자.
◆붉은 치마를 입은 듯 매혹적 자태에 압도=적상(赤裳)이라, 붉은 치마. 누구의 발상이었을까. 이 날카로운 은유는. 전국 산 이름 중 가장 낭만적인 이름이 아닐는지. 단풍에 뒤덮인 산의 풍경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어디 경치뿐이겠는가. 작명자는 산의 여성적인 매력까지 염두에 두었음이 틀림없다. 빨간 치맛자락에서 빳빳한 감동(?)에 젖어든다고 적상산 소회를 끄적거린 시인도 있다.
적상산은 덕유산과 함께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덕유산의 명성에 가려 제대로 명함을 내지 못했다. 겨울엔 설경과 상고대에, 봄엔 철쭉에 밀리고 여름엔 구천동 계곡에 뒤지니 언제나 부록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묘한 계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가을이다. 단풍이 세(勢)를 얻는 가을만큼은 덕유산도 아우에게 상석(上席)을 내주고 한걸음 물러나 준다.
적상산의 단풍나무는 일본산 노무라목(木)이 주종을 이룬다. 홍단풍으로 불리는 이 종은 봄에 붉은 잎을 틔우고 여름에 초록으로 색을 거두었다가 가을이면 다시 온산을 선홍색 파스텔톤으로 펼쳐 놓는다.
일설에 적상산 이름은 고려 말 왜구토벌에 나선 최영 장군이 무주를 지나가는 길에 지었다고 전한다. 야전(野戰)에서의 시름을 장군은 여기서 달래지 않았을까. 시상(詩想)이 떠오를 때 그의 눈엔 고운 님의 모습도 함께 어른거렸을 것이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두 가지. 서창주차장에서 등산로를 잡아 장도바위를 거쳐 정상으로 오르거나 치목마을에서 올라 적상호-안국사를 거쳐 향로봉으로 오르는 코스다.
오늘 산행은 본사 주최 여성산행대회에 참가한 250여 분의 미녀 건각(健脚)들과 함께했다. 일부러 휴가를 내고 달려온 교사, 강의를 빼먹고 달려온 여대생부터 배낭 대신 쇼핑백을 든 70대 할머니까지 다양한 사연들이 대열을 이루었다.
◆서창마을서 등산 시작, 산속은 온통 색동옷=치마의 끝단이 스친다는 서창마을.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마을은 고요하고 한적하다. 임도를 조심스럽게 펼쳐놓던 산길은 오른쪽 산길로 꺾이면서 본격적인 등산로를 펼쳐 놓는다.
산속은 컬러의 향연이었다. 여느 남도의 산들처럼 생강나무, 서어나무, 당(唐)단풍이 울창했다. 특히 중턱 이후는 연노랑 계열의 활엽수림이 대세를 이루었다.
길은 치맛단 주름처럼 펼쳐진다. 인견 깃을 박은 재봉 선(線)처럼 가지런한 길도 있고 허리춤의 마름질 선처럼 급한 경사 길도 있다.
돌고 꺾고 넘기를 1시간여. 첫 유적지 장도(長刀)바위 앞에 우뚝 선다. 수십 길 바위가 단칼로 내려친 듯 예리한 각(角)으로 쪼개져 있다. 민란을 진압하러 산으로 오르던 최영 장군이 바위가 길을 막아서자 큰칼로 내려쳐 길을 냈다고 전한다. 고려 말 충청, 호남지역에서 왜구를 막아냈던 장군의 기개가 느껴진다. 그러나 장군의 공적을 고민하기엔 시차가 너무 크다. 관광객들에게 바위는 그저 인증샷을 위한 소품일 뿐.
등산로는 바로 적상산성터로 연결된다. 성터 주변은 사방이 절벽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져 흔적만 남아있지만 전성기 때는 사방에 문루가 있었고 길이만 8㎞에 이르는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공민왕 때 최영 장군의 건의로 축조되었다고 전하며 거란과 왜구의 침입 때 군민들이 성터를 근거 삼아 전투를 벌였다.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주변 마을이 대부분 전화(戰禍)를 입었지만 무주는 이 성채 덕분에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정상에 서면 덕유산, 지리산 능선 한눈에=성터를 빠져나오면 서문삼거리. 옛날 서문의 누대(樓臺)가 있던 자리다. 삼거리서 왼쪽으로 빠지면 향로봉으로 가는 길. 향로봉의 조망은 정상이나 안렴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복잡한 인파를 피해 호젓하게 돌아보기에 좋다.
다시 삼거리로 돌아나와 정상으로 향한다. 길은 다시 가파르게 펼쳐진다. 등산 시작 1시간, 산은 드디어 정상을 허락한다. 숲을 열어 조심스럽게 조망을 펼쳐놓는다. 덕유산의 육십령-무룡산-향적봉 능선이 선명하게 펼쳐지고 멀리 북서쪽으로는 성삼재-반야봉-천왕봉 능선이 실루엣으로 일렁인다.
내친김에 10분 거리 안렴대(安廉臺)까지 내달린다. 안렴대는 거란 침입 때 안렴사가 진을 치고 피란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바위 절벽 위 누대에 올라선다. 산 밑에선 오밀조밀 들어선 마을이 정겹고 황금색 벌판 위를 대전~통영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뻗어간다.
정상에서 오찬을 마치고 근처의 안국사(安國寺)로 향한다. 안국사 위쪽은 우리나라 4대 사고(史庫) 중 하나였던 적상산 사고가 있던 자리. 광해군은 1614년 산성 내에 적상산 사고를 설치하고 사찰에 군사를 배치해 수비케 했다.
안국사 생수로 목을 축이고 대웅전 뒤로 난 소로를 따라 정상 길목으로 오른다. 길은 서문삼거리와 만나고 내리막길로 들어서면 다시 원점회귀 하산 길과 통한다.
길게 늘어선 행렬 위로 10월의 햇살이 일렁이고 얼굴엔 어느새 붉은 단풍잎이 하나씩 내려앉았다.
하산 길은 다시 여인들의 수다로 요란하다. 화려한 색감이 오감(五感)을 자극하는 단풍산엔 수다가 제격이다. 억새 산에야 무음(無音)이나 음소거 모드가 제격이겠지만.
글'사진 한상갑기자 arira6@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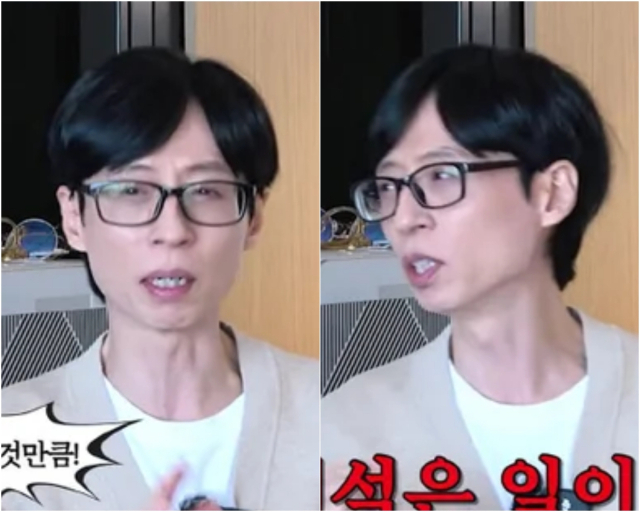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