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전에 끝이 났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려 12년 동안 연마한 교과 실력을 하루 동안 발휘해서 공정히 평가받는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항상 11월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날에는 국가 총체적인 연례행사로서의 긴장감이 묻어나고, 고사장 주변의 다양한 진풍경을 뉴스에 담아 보도하기도 한다. 심지어 시험 종료 후에 가채점을 해본 학생이 낮은 점수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우울한 사연을 들을 때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영국의 어느 공영방송 기자는, 한국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미래의 연봉과 지위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꼬집어 비평한 적이 있다. 또한 초등학생이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이 몇 년간 지속되기도 하고, 수능시험 당일에는 비행기 운항 일정과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이 조정되며 심지어 군인들이 기지 밖으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보는 시각에서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전혀 터무니없이 한 말은 아닐 수 있다. 학력이 삶에 있어서 곧 경제력과 결부될 수 있다는 상관계수를 드러낸 것이며, 어쩌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입시 평가로 재단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현주소의 씁쓸한 양상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열 및 성취 욕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과거 부모님 세대들은 물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에서 비록 당신들의 삶은 가난에 찌들고 고달플지라도 자식들만은 학력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부모의 으뜸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식들은 공교육의 제도권 속에서 오로지 열심히 공부만 하면 학업 성취 기반과 소망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 교육 여건도 많이 급변하여 공교육을 뛰어넘고 심지어 사교육 시장까지 폭넓게 기웃해야만 하는 현실에 봉착하게 되니,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부모들의 가계 부담은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느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시군구별 수능시험의 결과에서 학생이 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영역의 1'2등급을 받은 비율과 높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전문대졸 이상의 부모 학력과 어느 정도 비례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이것은 부모의 경제 능력이 자식의 교육 뒷바라지를 결정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빈부는 자식에게 자칫 대물림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벌이 좋아야만 경제력도 나아질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치를 야기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자꾸만 학벌에 집착하게 되는 사회 병리적 악순환을 거듭할 수도 있다.
그런데 더욱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동향은 그다지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고학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들이 사회 고용 창출 면에서 저마다의 전공 분야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한 채 해마다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 평생직장이라고 여기고 일하던 사람들이 정년보다 일찍 퇴직해야 한다는 사회 우스갯소리 풍자어 '오륙도(56세)' '사오정(45세)' '삼팔선(38세)' 이라는 말에 강박관념을 느끼며 살아가는 지금, 이에 더해'십장생'(십대 나이에 벌써 장래 생활고를 걱정해야 한다는 말)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옴으로써 왠지 자꾸만 숙연해지는 느낌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바라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학벌이 사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야 할 학교는 살벌한 생존경쟁의 각축장이 아니라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인성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년간 학업에 열중하며 한 길을 달려온 수험생들이 하루 동안 자신의 장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는 평가를 치르느라 무척 진땀을 흘렸을 것이다. 고생한 만큼 휴식의 시간도 필요하리라고 보며, 아직도 여전히 '학력=경제력'이라고 여기는 사회 병리적 현상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남은 과제라고 하겠다.
김국현/올브랜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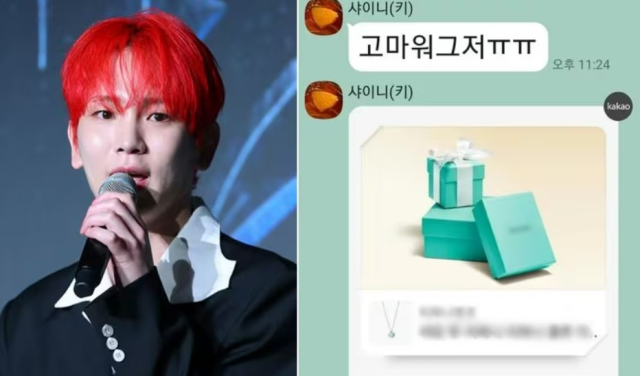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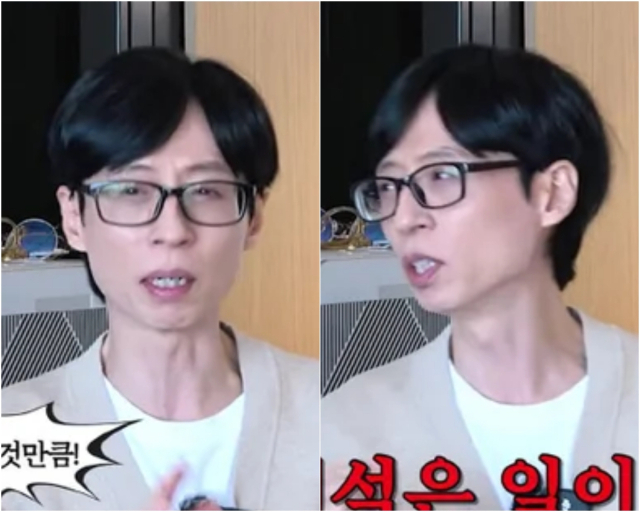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