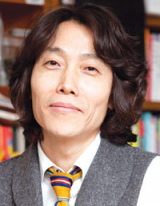
얼마 전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 처음 하루는 답답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꼭 필요한 전화연락을 받지 못할까 봐 불안했다. 동시에 몇 가지 증후군이 나타났다. 진동이 울리는 것 같아 주머니를 뒤져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전화벨 소리를 내 것인 듯 착각하기도 했다. 이틀째,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날 하루가 선물 받은 휴일처럼 일상의 속도가 조금은 느리게 진행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다. 3일을 채 못 넘기고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했지만, '누군가와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한 상태'로의 복귀가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소유의 종말'(원제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이라는 책에서 "소유의 시대는 가고 접속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든, 메신저이든, SNS와 인터넷이든 우리는 접속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많은 정보를 교환하며 살아간다. 어쩌면 '얼마나 많은 사람, 또는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능력을 표시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깊이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정보는 이렇게 우리 앞에서 '티라노사우루스'처럼 부피만 비대해져 간다. 그야말로 데이비드 셴크(David Shenk)가 말한 것처럼 '정보 안개'(Data Smog) 속을 우린 불안하게 걷고 있다는 생각이다. 하루로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정보의 습득과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컴퓨터에 의존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만 간다.
우리는 70평생 가운데 14년을 TV 앞에서 살아가고, 이메일이나 광고성 우편물을 보는 데에만 8개월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한다. 우리가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통계내 보면, 아마 친구나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오늘 아침,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접속을 시도했을까?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켜는 TV?, 혹은 출근하자마자 부팅시키는 컴퓨터? 아마, 데카르트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관찰한다면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만들었으리라. TV가 등장했던 시절처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환상을 갖게 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 몇 년 전, 모 통신회사가 내보냈던 기업광고 중의 한 대목이 생각난다. '문자기능을 없애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긴 연애편지를 쓰도록….'
언제든 세상에 접속 가능한 디지털 장비들을 갖추고 누에고치처럼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현상을 가리켜, 미래학자 팝콘은 '디지털 코쿠닝'이라 설명한다.
누에고치처럼, 일상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자신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보자. 새장처럼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꿈꿔왔던 것들을 시작해 보자고. 속도를 강요하는 디지털 세상을 끄고, 얼굴에 부딪치는 바람의 숨결을 느껴보자고 스스로를 유혹해보자. 다음으로만 미뤄왔던,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약속들을 다가올 계절에는 실행해보면 어떨까. 마음만 늙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순간이 오기 전에,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면 어떨까?
지금 잠시라도, TV나 컴퓨터를 끄자. 화면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주변을 잠시만이라도 거닐어 보자. 오늘 하루는 가능하다면 스마트폰도 진동 모드로 바꿔보고, 온전히 아날로그적 삶을 살아보자. 메신저로 대화하는 성급함 대신에, SNS에 접속해서 의미 없이 배회하는 대신에, TV가 제공해주는 편집된 화면 대신에, 인터넷에 검색되는 자극적인 기사 대신에, 마음속에 찜해 둔 한 권의 책을 읽어보자.
오랫동안 방치해 둔 만년필에 잉크를 채워 넣고, 문득 그리운 사람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문득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여행 서적을 뒤적거려도 보고, 좀 더 욕심을 내서 이번 주말에는 외도해상농원에 가는 여객선을 타보면 어떨까. 자전거로 땅끝마을까지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바람이 좋다. 책상에 묶인 마음을 풀고, 어디로든 떠날 음모(?)를 꾸며보기에 충분한 계절이다.
임헌우/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댓글 많은 뉴스
[인터뷰] 추경호 "첫째도, 둘째도 경제…일 잘하는 '다시 위대한 대구' 만들 것"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판사·경찰·CEO·행정가…이번 대구시장 地選 '커리어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