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경'(孝經)이란 책도 지은이와 출현 시기를 알 수 없는 책이다. 대체로 학자들의 합의에 의하면 공자의 70제자의 저작으로 보고 있다. 출현 시기는 현재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대체로 BC 3세기로 보고 있다. 송나라 때의 유학자 주희는 '효경'의 글이 이치에 맞지 않고, 또 편차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효경간오'(孝經刊誤)를 지었다. 중국의 청나라 말 근세학자 양계초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읽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역대 통치자들에게는 높게 평가되면서, 한나라 시대에는 공자의 저술로 생각해 '춘추'의 위치에 올리기도 했다.(한나라 때는 '오경'의 편찬과 더불어 공자가 신격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나라 때 왜 이처럼 '효경'을 존숭하게 된 것일까? 여기에는 동양의 정치체제와 '효'의 문제가 놓여 있다. '효'의 원래 의미는 노인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와 연관하여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의미도 겸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효도'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
중국 고대 주나라는 사회조직이 '종법(宗法) 사회'였다. 이는 혈연의 친소에 의해 구성된 대가족 제도였는데, 국가경영에서 가정 질서에까지 일관된 사회윤리였다. 그 후 이 종법 질서가 무너지고 천하가 혼란에 빠질 즈음 이 책이 나왔다. 특히 진시황의 법가사상에 의한 전체주의 통치 방식이 천하를 더 혼란하게 한 데 대한 반동으로 옛 질서를 회복시켜 보려는 생각에서 나왔다. 이미 천하경영이 법가적 조직, 즉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아니면 다스릴 수 없는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기본은 절대왕정 체제였으므로 이 책의 효용에 대해 역대 왕조는 주목하게 됐다. 농업경제 구조에도 맞고, 효로부터 충(忠)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효로써 천하를 다스린다는 취지가 이 책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나라 이후로 동양 전제왕조에서 충효 일체로 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갔다. 그러므로 '효경' 제1장에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효라는 것은 덕의 근본이다. 효는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그 중간이며, 자기 몸(인격)을 세우는 것이 그 끝이다"고 했다.
'효경'은 더 나아가 '인륜의 근본'을 넘어서서 '하늘의 법칙'이며, '땅의 영원한 질서'라고까지 했다. 1934년 중국 국민당 정부는 공자를 숭앙하고, 이 책을 학교 필독교재로 삼았다. 송나라 승려가 '효론'을 짓기도 했다. 그러나 왕조체제와 관계없이 보면 효는 인간의 기본 심성, 즉 사랑과 공경이며, 오늘날 '가족복지'와도 유관하며, 사회 기초인 가족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이동희 계명대 윤리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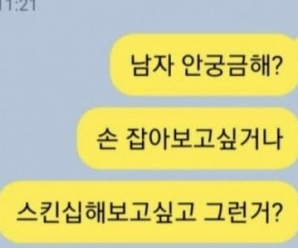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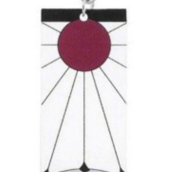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