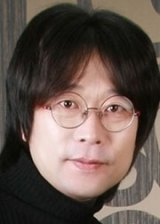
지구 상에서 명품 소비가 한국과 일본만큼 대중화된 나라도 드물 것이다. 남의 나라야 어찌 되었건 관심 접어두고 내 나라 모습만 살피면 글로벌 시장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명품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명품 소비 경향은 커피 같은 기호식품의 브랜드 선호에서도 나타나고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불경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시장인데 흔히 말하는 명품은 짭짤한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그러니 너도나도 이름 있고 큰 작품만 무대에 올리려고 혈안인가 보다.
대중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은 명품을 사용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상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쌀수록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경향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에서 상류층의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이뤄진다고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비 경향을 따른다고 했다. 이를 베를렌 효과라고 하며 소비 경향을 '트리클다운'(trickle-down)이라고 하는데 이게 1899년에 나온 말이다.
100년도 지난 이론이 현재의 한국 사회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돈을 좀 더 가지게 된 것 외에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특히 계급적 기호에 지나지 않는 명품 소비가 문화 소비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허상의 내러티브다. 안트베르펜 대성당의 루벤스 그림을 갈망하던 네로(플란더스의 개의 주인공 소년)쯤은 되지 않더라도 애호의 정도로 문화 소비가 이뤄져야 할 텐데 브랜드 집단에 속하려고 소비가 이뤄지니 짝퉁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알 만하다. 물론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야말로 명품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말만 명품인데 상류층 소비 이미지를 등에 업고 그런 척하는 것은 짝퉁 소비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인다.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명품의 이미지를 벗어던진 반신분(anti-status) 전략이 마케팅의 보편성으로 자리한 서구의 경우와도 다르다.
문화 소비가 명품에 집중되다 보면 지역 문화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뜩이나 창작여건이 열악한 지역 문화계에서 창조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창조적 청년 문화가 항상 좌절한 것도 명품에 집중된 문화 소비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니 떠날 수밖에.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꾸준히 창조적 청년문화는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추억이 되어 버린 문화신문 '안'을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도 꿈틀대는 청년들의 움직임에 찬사를 보낸다.
권 오 성(대중음악평론가) museeros@gma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