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대는 엎질러진 물처럼 살았지
나는 보슬비가 다녀갔다고 말했지
나는 제비가 돌아왔다고 말했지
초롱꽃 핀 바깥을 말하려다 나는 그만두었지
그대는 병석에 누워 살았지
그것은 수국(水國)에 사는 일
그대는 잠시 웃었지
나는 자세히 보았지
먹다 흘린 밥알 몇 개를
개미 몇이 와 마저 먹는 것을
나는 어렵게 웃으며 보았지
그대가 나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으므로
그대의 입가에 아주 가까이 온
작은 개미들을 바라보았지
-시집『그늘의 발달』(문학과 지성사, 2009)
개미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 숨이 넘어가면 금방이라도 시신을 끌고 갈 것만 같은 느낌이다. 문병에서 쾌유가 아니라 죽음을 감지하는 시인의 마음이 아슬아슬하다.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에 나오는 섬뜩한 예언을 보는 것 같다. 죽은 아이를 끌고 가는 개미떼. 실제로 나는 개미가 시신을 끌고 가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다만, 벌레의 사체나 음식 찌꺼기를 나르는 개미는 본 적이 있다. 혼자서 안 되면 여럿이서 뻘뻘 거리며 끌고 가는 모습이라니.
문태준 시인의 명편들 중에는 「가재미」라든지「백년」이라든지 문병을 주제로 하는 시가 여럿 있다. 병석에 든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아픈 쪽으로 자주 손을 내미는 행위는 시를 쓰는 마음과 닮았다. 그러나 병이 위중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가 쉽지 않다. 십중팔구는 거짓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엉뚱한 말을 하며 그저 손을 꼭 잡고 있을 수밖에. 이럴 땐 그의 시 「백년」에서처럼 문병을 마치고 혼자 술집을 찾게 될 것이다. 대신 해 줄 수 없는 것들 중 앞을 다투는 게 병고이자 죽음이다.
시인 artandong@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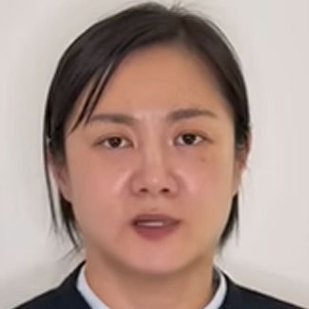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