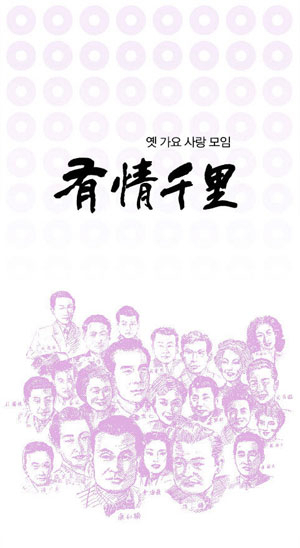
옛 가요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유정천리'(有情千里)입니다. '유정천리'라는 이름에는 옛 가요와 우리 문화를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유정(有情)한 가슴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만나 가요 사랑의 방법을 의논하며 고독하고 쓸쓸한 천리(千里)의 인생길을 함께 오순도순 걸어가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정천리'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09년 11월 2일, 서울 '한국의 집'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뒤로 오늘까지 어언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정천리'는 그냥 가요 동호인들이 모여서 가요를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그야말로 온갖 파란과 굴곡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민지 제국주의 침탈로 말미암은 36년의 고통, 그리고 잠시도 틈을 주지 않고 파도 쳐온 분단과 전쟁의 고통 및 상처, 이런 불안정 속에서 전체 한국인들은 노래를 통해서 힘겨운 세월을 통과해 왔습니다. 삶이 그토록 힘들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그 특유의 낙천성으로 괴롭고 힘든 시간에도 항시 한잔 술에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노래로 가슴속의 상처를 치료하고 스스로를 위로 격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노래의 위력과 공로는 대단하겠지요. 지금도 라디오와 TV의 공개방송에 등장하는 가요 프로그램에서 가요에 심취한 대중들의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식인들의 경우 비천한 문화의 산물로 간주하며 '뽕짝'이니, '딴따라'니 하는 혐오스런 표현과 비뚤어진 관점으로 비판을 합니다. 실상 그들이 즐기는 음악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우리 것을 혐오하고 남의 것에 그렇게도 심취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품격 높은 것이라 자평하는지요.
일요일 낮, TV 프로그램에서는 어김없이 전국을 순회하며 운영하는 가요콩쿠르가 방영이 됩니다. 그 무대 앞에서 항시 춤을 추며 노래를 즐기는 민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옛 모습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열리던 결혼, 회갑 등을 비롯한 잔치 자리에서 그러한 모습을 익히 보아왔습니다. 술 잘 마시고, 재담 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던 집안 취객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서양음악의 품격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천박하다고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가요는 일찍이 제국주의 침탈 과정에서 기독교의 찬송가와 창가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부터 내려오던 민요와 잡가, 시조와 판소리 사설 따위의 전통과도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지요. 그러다가 1930년대 초반, 일제의 레코드 상업자본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대중문화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 땅의 작사가, 작곡가, 가수들은 우리만의 고유성을 지닌 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낸 노래들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옛 가요이지요.
북한에서는 이 시기의 대중가요를 '계몽기시대의 애국가요'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당시의 가요 작품 속에는 일제강점기하에서 압박과 굴욕을 겪으며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 피눈물, 가슴속의 상처와 비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기 위한 의지로 넘실거립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옛 가요를 사랑하고 길이 보살펴야 할 이유가 발생하는 것일 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가요는 마치 가을날 가랑잎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 소중한 자료를 제대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당시의 음반은 모두 축음기판, 혹은 유성기판이라 부르는 SP음반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파손되기 쉬운 음반이 사라지면 영영 노래의 자취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옛 가요는 아직까지도 문화적 번지를 제대로 찾지 못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앞에 황폐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순(영남대 국문학과 교수)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