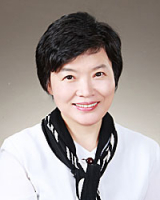
미국 공립공문서관에서 폭로된 문서에 따르면 조지 W 부시의 할아버지로 상원의원이던 프레스콧 부시는 나치 독일의 재정지원자들을 위해 일하며 큰 돈을 벌었다. 프레스콧은 나치에 협조한 프리츠 티센이 설립한 유니언은행의 이사로 티센이 자산을 빼돌리도록 개입하면서 '검은 부'를 쌓았다. 프레스콧 부시가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나치가 밀어준 피묻은 돈으로 부자가 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속였다면, 이란을 악의 축으로 선포한 부시 시절, 그의 삼촌 버키 부시는 이란 회사와 거래하며 축재했다. 부당거래로 이룬 부로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부시 가문의 비밀은 음모가 아니라 사실이다. ('세계를 속인 200가지 비밀과 거짓말' 참고)
소크라테스는 거짓말 그 자체가 악일 뿐 아니라, 악으로 영혼을 물들인다고 했다. 살아있는 권력자나 정치인은 은밀한 사생활을 덮거나 부정부패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해댄다. 유권자가 정치인의 부패나 거짓말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재선, 3선을 보장받으며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수사권이나 징세권 입법권을 지닌 권력기관장이 거짓말을 하면 조직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떨어뜨리며 조직까지 망가뜨린다. 그래서 공직자와 살아있는 권력은 딱 2가지, 돈과 성(性)을 멀리하라고 했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은 진실과 거짓말, 영광의 길과 브레이크 없는 추락의 기로에 서있다. 앞으로 길어도 한 달 이내에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청와대와 민정수석실은 채 총장이 화가 출신인 임 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우리 아빠가 검찰총장"이라는 소문의 근거지로 알려진 채 군의 학교 등에서 입수한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혈액형 등을 파악했고, 임 씨 주변 조사로 채 총장이 혼외 아들을 둔 것 같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인사청문회에서 "파도 파도 미담" 뿐이라던 채 총장의 뒤를 캐는 취재가 시작되면서, 채 군은 지난 8월 미국으로 보내졌다. 아무리 존경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아들 이름에 따면 모를까 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부에 함부로 올리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채 총장의 말바꾸기는 이어졌고, 사퇴의사를 발표하면서 검찰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일이 커졌다. 채 총장의 사퇴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도 하기 전에 젊은 검사들은 항명의 기류를 보였고, 김윤상 대검 감찰 1과장도 반발성 사퇴 의사를 밝혔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깨끗하냐 않냐, 혼외 아들을 두었느냐 아니냐는 논란은 순식간에 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으로 번지다가 제동이 걸렸다.
법무부 훈령 감찰규정(22조)에 근거해 감찰을 받고 있는 채동욱 총장의 앞에는 2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역대 39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있다. 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무원의 축첩은 사생활이 아닌 범죄"라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그 일이 유전자 감식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이다.
이 경우라면 권력투쟁의 막장 드라마나 마찬가지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아무리 국회 야당 법사위원들과 친하다고 한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국정원 댓글사건과 상관없는 뇌물 수수로 별건 구속을 했든 그가 명백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남은 임기 동안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최강 검찰총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검찰 개혁, 국정원 수사, 각종 사회 개혁도 채동욱 총장의 스타일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엉터리 보도를 한 조선일보는 사운을 건 배상을 해야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내일은 없다. 법무부 감찰 이전에 은근슬쩍 사퇴해서, 의혹만 부풀린채 민사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사사건건 청와대와 견해차를 보인데 따른 희생양처럼 그리려던 꼼수가 들통남은 물론, 아버지로서 얼굴도 들기 어렵다. 의혹이 제기될 때 차라리 사생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한 아들의 아버지로 돌아갈 것을 후회해도 때는 늦었다. 다만 채동욱 스캔들이 권력기구 내의 묵과할 수 없는 싸구려 투쟁은 아니길 바란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