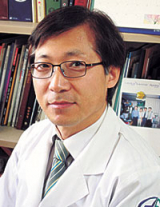
인턴으로 처음 의사 생활을 하던 당시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바로 '가망없는 퇴원'(hopeless discharge) 때 앰뷸런스에 함께 타는 것이다. 당시 법적으로 환자를 태운 구급차에는 의료인이 반드시 동승하게 돼 있어서 집에서 임종 맞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의사 중 가장 말단인 인턴이 모셔다 드리는 것이다. 병원에서 숨을 거두는 것은 객사(客死)라고 생각한 탓에 병원에서 치료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집으로 모셔가는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위암 수술 후 끝내 회복하지 못한 환자를 집으로 모신 적이 있었다. 앰뷸런스 안에서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환자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수술 후 금식 기간이 길었고, 물 한 모금 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도 많이 변했다. 이제는 집에서 임종을 맞겠다고 퇴원하는 환자는 드물다. 오히려 오랫동안 집에서 요양을 하다가도 임종이 가까우면 병원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임종이 가까운 환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어서일 수도 있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례를 치르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의 죽음은 참으로 쓸쓸하다. 가족들 대신에 의료진과 생소한 기계들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으로 꺼져가는 생명에 또 다시 고통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품위 없는, 몰인정한 죽음이다.
그런데 임종을 앞둔 많은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무서운 병원보다는 자신에게 익숙하던 환경에서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의 바람을 들어주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 일단 퇴원 후 가족들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이 없다. 의사의 왕진이나 가정방문 간호 등이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다. 또 인공호흡기 등으로 연명치료를 하던 환자의 치료 장비를 제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로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뇌사상태이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환자들에게 '가망 없는 퇴원'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들어주는 퇴원'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기를 희망한다.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