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 년 전 미술 담당 기자 시절 이우환 씨 작품을 자주 볼 기회가 있었다. 고 이태 씨가 봉산동 시공갤러리를 운영할 때였는데, 한강 이남에서 유일하게 그의 작품을 다루는 화랑이어서 여러 점이 걸려 있었다. 흰 바탕에 굵은 선이 일직선으로 그어진 작품들이 많았는데, 화가들과 "바게트 빵 같아서 먹고 싶다"며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곤 했다.
당시 이우환 씨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난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전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최고 화가였지만, 한국에 오면 다소 냉대를 받았다. "한국 화단은 저를 일본놈이라고 매도해 왔다.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것 말고 무슨 잘못을 했나." 그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항변했다. 학교, 인맥을 중시하는 한국 화단의 풍토에 비춰 충분히 나올 법한 소리였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유려했지만, 민감한 문제가 나올 때면 격정적이고 직선적이었다. 말투와 기질만 보면 일본인의 정서와는 아주 거리가 먼 화가였다. 요즘 대구에서 '이우환과 그 친구들 미술관' 반대 운동론자들이 '일본 화가' '왜색 화풍'이라고 하니, 그가 10여 년 전에 했던 항변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이우환 미술관' 추진 과정을 보면 반대 여론이 이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구체적인 전시 계획이 없고,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니 자존심 상할 일이다. 그 와중에 혹자는 300억원에 달하는 건립비를 대구 근현대미술관 건립에 쓰자고 한다. 행정기관에 오래 출입한 경험에 비춰볼 때 그 큰돈을, 아니 일부라도 미술계로 돌릴 만한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은 거의 없다. 공무원들은 그 건립비를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 확보, 즉 관광 인프라에 쓰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이러다간 '이우환 미술관'도 잃고 '근현대미술관'도 잃어버릴 것이다. 대구시의 저자세도 논란거리인 모양인데 비즈니스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게 아니던가. 협상력 부재는 욕먹어 마땅하지만, 대구에 '세계적인' 것이 그리 쉽게 오겠는가. 대구의 도시 경쟁력과 여건을 돌아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인내심을 갖고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도 반대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실이다.
며칠 전 포항의 유력인사가 진심 어린 제안을 해왔다. '대구가 하지 않으면 포항에 유치해 명소로 만들자.' 대구에 굳이 짓지 않아도 좋다. 경북지역이면 더욱 좋겠다. 그리되면 누가 뭐래도 이우환과 친구들, 안도 다다오의 작품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러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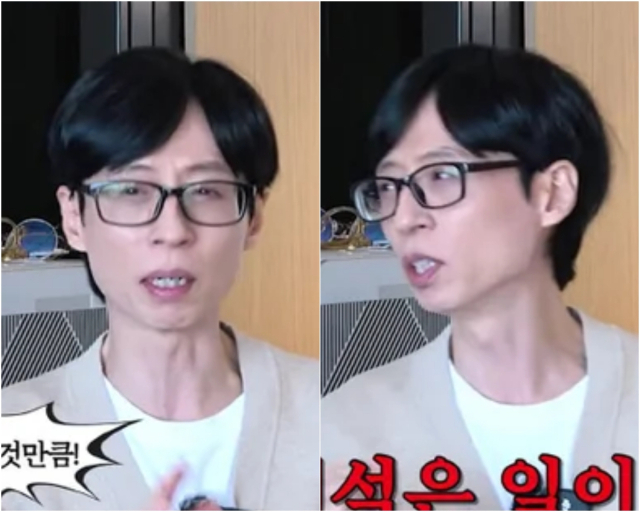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