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체는 험난한 운명을 사랑했다. 그는 사랑하던 여인 루 살로메로부터 거절당하자 굴욕감과 모욕감으로 분노하며, 여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그는 생애 마지막 10여 년을 매독에 의한 진행성 마비로 식물인간처럼 지내다 죽었다. 그럼에도, 그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정신적 평정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다. 초인적인 삶을 살다간 인류사의 드문 천재였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초인으로 살 수는 없다. 더구나 경제적 안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이고, 호주머니가 비어 있는 상태로는 행복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 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온 60대 남자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세든 집이 당장 철거당하게 되자, 유서를 남기고 삶을 포기하였다.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라고 적힌 봉투 안에는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었다. 자신의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만원,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든 봉투도 함께 있었다.
평생을 일용직으로 고된 삶을 살았지만, 최후를 맞이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의 성품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반듯하고 강직했을 그의 인생에 노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단칸방 보금자리가 위협받자 더는 기댈 곳도, 더 나은 미래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는 혼자서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자,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기에 씁쓸한 뉴스였다. 자존심을 지키려 애쓴 그를 니체적인 삶을 살다간 품위 있는 인간의 최후라고 위안만 삼을 수 있는 것일까?
지난해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갤럽과 헬스웨이스는 전 세계 135개국 국민의 행복지수(Gallup-Healthways Well-Being Index)를 조사하였다. '육체적 건강' '금전적 안정성' '공생적 사회관계', 거주지를 비롯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및 '목적의식'으로 크게 5가지 영역에서 질문을 하였다. 이들 5개 분야 중 3가지 이상에서 만족감을 보이는 국민의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세 가지 이상 항목에서 만족하고 있는 국민의 비율이 14%에 불과하여, 조사대상국 135개국 중 74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는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잃은 것도 너무 많다. 농어촌 중심에서 도시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행복의 5가지 조건 중에서 '공생적 사회관계', 거주지를 비롯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만족도' 및 '목적의식'과 같은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잃어버린 것에 정비례하여,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과거의 농촌사회는 인간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런 덕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시금 현대화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자고 할 수도 없다. 실효성 있는 노후대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개인의 책임으로 문제를 전가하기에는 노령화 사회가 너무 비대해졌고, 이것은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점점 커져만 가는 노후불안을 해결하려면 공동체 의식의 회복에 버금가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심각한 재정 적자로 허덕이는 연금제도를 개혁할 필요성은 높다지만,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공무원들의 불만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 중에는 국가재정에 대한 건전한 우려도 있지만, 그동안 느껴온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받으려는 반동심리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다. 행복한 노후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생적 사회관계 회복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정부나 여당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한 전 국민의 노후대책을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석화/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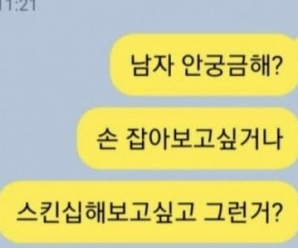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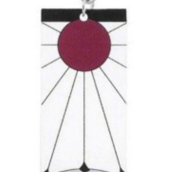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