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李重煥'1690~1752)은 자신의 인문 지리서 택리지(擇里志)에서 '조선 인재의 반은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은 선산(구미)에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구미(선산)는 고래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야은 길재 선생을 비롯해, 사육신 하위지, 생육신 이맹전, 김숙자, 영남 사림의 종조 김종직,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이 모두 구미의 정기를 받은 인물이다. 구미를 대표하는 산은 금오산이다. 금오산에는 어떤 정기와 사연이 있기에 이처럼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을까. '신화와 현실을 잇는 금오산' 시리즈를 통해 금오산의 자연환경과 금오산이 간직한 이야기, 금오산이 배출한 인물 이야기를 소개한다.
◆금빛 까마귀 산, 금오산!
저녁 예불을 마친 아도화상은 대웅전 뜰 앞에 나와 섰다. 마침 해는 천지를 붉게 물들이며 금오산 꼭대기 너머로 기우는 중이었다. 아도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광경에 검지로 두 눈을 비비며 다시 금오산을 바라보았다. '내가 헛것을 보았나….'
헛것이 아니었다. 천지를 덮을 만큼 넓은 금빛 날개를 펼친 까마귀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중이었다. 날개 아래로 세 개의 거대한 다리가 햇빛을 가리며 검게 물들고 있었다. 바로 금오산의 세 봉우리, 즉 현월봉(懸月峯'976m)과 약사봉(藥師峯), 보봉(普峯)이었다. 붉은 햇빛은 구름과 어울려 금빛 날개가 됐고, 금오산 정상의 세 봉우리는 다리가 돼 비상하는 중이었다.
아도화상이 선 자리는 금오산의 동쪽, 낙동강 건너 도리사(桃李寺)였다. 그는 불목하니를 불러 벼루와 먹을 가져오게 했다. "너의 눈에도 저 다리 셋 달린 새가 보이느냐? 예부터 태양 안에 발이 셋 달린 금까마귀가 산다고 했다. 태양은 천지만물의 핵이요, 그 안에 사는 금까마귀는 그 핵의 정수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 금까마귀의 둥지가 저 산에 있었구나. 저 산이 바로 금까마귀 산이었구나." 아도화상이 아득해진 눈으로 태양과 이어진 금오산을 바라보는 사이 큰 날개를 서너 번 휘젓던 금빛 까마귀는 홀연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고난 닥칠 때 거인이 걸어올 것
아도는 선 채로 붓을 들어 '金烏山'(금오산)이라고 썼다. 아도화상이 붓을 놓고 다시 산을 바라보았을 때, 금까마귀가 떠난 자리에는 엄청나게 큰 거인이 누워 있었다. 거인의 얼굴은 사색에 빠진 듯, 잠든 듯 고요했다. "사람과 나라에 큰 고난이 닥칠 때, 금빛 까마귀가 품고 기른 저 거인이 금오산에서 나와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올 것이다. 그 거인은 사람의 고통과 배고픔을 어루만져 사람과 나라를 바르게 할 것이다. 금오산의 거인은 산과 세상을 들고나며 사람을 보살필 것이다." 혼잣말처럼 내뱉는 아도화상의 말에 아직 어린 불목하니는 미욱한 눈만 끔뻑거렸다.
아도(阿道)는 고구려에서 신라로 들어온 승려다. 아도의 어머니 고도령은 중국 위(魏)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신라 땅에는 7곳의 큰 가람 터가 있다. 모두가 불전의 인연지로, 신라는 앞으로 불법이 깊이 전해질 땅이다. 너는 그곳에 가서 대교를 전하라"고 했다.
아도가 신라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달리 아직 불교가 전파되지 않은 나라였다. 위험을 무릅쓰고 신라 땅에 들어온 아도는 신라 눌지왕(417년) 때 도리사(구미시 해평면 송곡리)를 창건했다. 아도화상의 어머니 말씀대로 훗날 신라는 삼국 중에 불교문화를 가장 화려하게 꽃피운 국가로 발전했다. 불교문화는 신라 삼국통일의 근본적인 힘이 되었으며, 호국불교의 시원이 됐다.
◆여전히 신화 속에 있는 금오산
금오산은 신화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금오산은 안개 자욱한 신화 속에서 말없이 세월을 보내지만 나라에 인재가 필요할 때마다 '거인'을 보내주었다.
금오산의 정기를 받아 이 땅에 온 사람들 중에는 학자와 정치가도 많았고, 예술가도 많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제 몸과 가족의 안위를 던진 지사도 많았고, 문인문객도 많았다.
그런가 하면 평범하고 고된 삶을 묵묵히 살아냄으로써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어준 사람도 많았다. 오늘날에는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구미를 건설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젊은 인재들이 살고 있는 곳이 또한 구미다. 신화 속에서 나온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됐다.
오늘날 금오산은 여전히 신화 속에 있다. 우리는 금오산을 다 알지 못한다. 홀연히 안개가 걷히고, 신화의 세상에서 또 어떤 거인이 나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떤 역사를 쓸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금오산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까닭이다. 조두진 기자 earful@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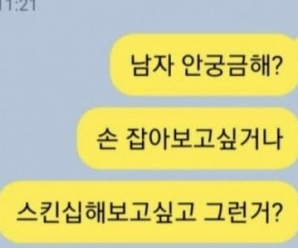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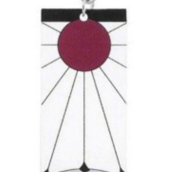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