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개월 동안 주말도 휴일도 없이 대구 곳곳 골목길을 다니며 대문, 창호, 담벼락 등에 있는 각종 문양 및 문자 약 500점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눈길은 끈 것은 고려 및 조선 시대를 거치며 민간에 널리 쓰인 전통 문양 및 문자들이었다. 지난 20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전통 문양 및 문자를 대문과 창호를 제작하고 담벼락을 쌓을 때 활용했다는 증거다. 이제는 대문 대신 현관문을 설치하고, 창호보다는 '새시'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며, 아파트의 보급으로 담벼락을 따로 쌓을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오래된 미로골목은 어쩌면 앞으로 더 이상 건축물에 새겨지지 않을 문양 및 문자를 관람할 수 있는 소박한 박물관이다.
◆전통 문양 및 문자 새긴 골목길 화첩, 대문
골목길이 아니면 접하기 어려운 건축 양식이 있다. '대문'이다. 우리 조상은 문을 출입구뿐 아니라 집안의 복과 액운이 드나드는 곳으로도 여겼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대문을 활짝 열고 복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요즘 현관문은 여러 개의 잠금장치를 달아 도둑 등 외부의 출입을 막는 기능에 중점을 둔다. 옛날 문은 그렇지 않았다. 문의 순 우리말은 '오래'이다. 그런데 오래는 '거리에서 문으로 통하는 좁은 길'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고, 함경도 사투리로는 '동네'와 '이웃'을 가리키기도 한다. 지금의 문이 '차단'에 방점을 둔다면, 옛날 문은 '연결'을 좀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대문을 통해 복은 얻고 액운은 막으며 잘 살길 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세기까지만 해도 대문에 다양한 문양 및 문자를 새겼고, 바로 여기서 당시의 세시풍속이나 신앙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이 원하는 문양 및 문자를 대문에 직접 새긴 사례는 찾기 힘들었다. 대부분 대문제작업자로부터 기성품을 구입했거나, 건축업자가 분양한 주택에 입주하고 보니 건축업자가 대량으로 납품받아 설치한 대문을 사용하게 되는 식이었다. 골목길에 가면 똑같은 문양 및 문자가 새겨진 대문이 연이어 설치돼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복 부르는 길상 디자인
우리 조상들은 복을 얻기 위해 좋은 일이 있을 조짐을 가리키는 다양한 길상(吉祥)문자를 의복이며 가구며 건축물에 새겼다. 대구의 골목길 속 대문 전면이나 문고리 등에서는 쌍희(囍), 수(壽), 복(福) 등의 길상문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쌍희(囍)는 기쁜 일(희, 喜)이 겹치거나 잇달아 일어나길 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 북송 때의 시인이자 정치가 왕안석의 고사 쌍희임문(雙喜臨門)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또 부부가 서로 즐거움을 나눈다는 의미인 용호상희(龍虎相喜)가 음양의 조화나 사람들 간 화합의 뜻으로 확장된 것이라고도 한다. 수(壽)는 수명을 의미한다. 복(福)은 말 그대로 행운과 행복을 뜻한다. 이 두 글자는 합쳐져 '장수'를 의미하는 수복(壽福)이라는 단어로 쓰인다. 수복은 여러 복 중에서도 으뜸으로 여겨져 왔다. 수명이 짧다면 많은 부와 명예도 소용없음을 이미 조상들도 중요히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골목길 속 대문에서 전통적인 길상문자에는 없는 충(忠)과 효(孝)라는 글자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공자가 말했고, 우리 조상들이 종이에 써서 대문에 붙이기도 한 문구인 가전충효 세수인경(家傳忠孝 世守仁敬, 충효의 법도를 전승하고 사회에서는 인자하고 공경하는 기풍을 지켜라)이 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글자보다는 문양에 가까운 것들도 길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 많은데, 역시 대문에 주로 새겨졌다. 만 또는 완(卍)은 민가는 물론 궁궐, 사찰, 전각 등에 두루 새겨진 문양이다. 산스크리트어로 스바스티카(swastika)라고도 하는데 태양 또는 행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쓰였고, 복이 모이는 곳을 가리켰다. 불교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 숭유억불 정책이 실시된 조선시대에도 불교적인 뜻은 희석된 채 민간에서 계속 쓰였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점집 대문이나 주변 벽면에서도 간혹 찾을 수 있다.
태극은 우주와 영원함을 가리키는 문양인데 점차 길상의 의미도 갖게 됐다. 주로 볼 수 있는 것이 음양을 가리키는 2태극이고, 천지인을 뜻하는 3태극도 있다. 주로 향교와 사당 대문에, 궁궐이나 사찰 계단에 새겨졌다. 대구에서는 대구향교와 칠곡향교에 가면 입구 대문의 커다란 태극 문양을 볼 수 있다.
우리 조상은 대문, 창호, 담벼락에 문자 및 문양을 연속된 기하학적 무늬로 새기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회문(回文)이다. 아(亞)자가 계속 이어지는 아자문(亞字紋), 만 또는 완(卍)자로 구성된 만자문(또는 완자문), 거북의 등에 새겨진 무늬를 인용한 귀갑문(龜甲文) 등은 문자 또는 문양이 영원히 뻗어나가는 무시무종(無始無終) 형식으로 장수, 부귀, 풍요 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액운 막는 벽사 디자인
길상과 함께 우리 조상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바로 벽사(벽邪)다. 귀신을 물리치는 것, 즉 재앙과 재난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벽사를 위해 주로 부적이 쓰였다. 골목에 가면 사찰이나 점집에서 받은, 빨간 글씨가 적힌 누런 종이를 대문에 붙여놓은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부적이 종이로만 제작된 것은 아니다. 우리 조상은 돌부적, 나무부적, 청동부적, 대부적(대나무로 만든 부적) 등 다양한 소재의 부적을 만들어 썼다. 또 필통과 문갑 같은 생활용품에도 부적을 새겼다. 대구의 골목길에서는 20세기에 새롭게 도입된 부적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대문에 새겨진 것은 아니지만 대문 옆에 설치된 초인종 부적이다. 또 대부분 길상의 의미를 담은 회문들 중 뇌문(雷文)은 번개와 천둥, 또는 두 마리 용을 상징하는 맴돌이 줄무늬로 악귀를 쫓는 벽사 역할을 부여받았다.
◆사자가 지키던 골목길
대구 곳곳 골목을 다니며 가장 많이 본 대문 문고리 디자인이 있다. '사자' 얼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속신앙, 설화, 각종 장식에 두루 등장하는 짐승은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다. 사자 얼굴 장식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예 사자를 도시의 상징으로 삼아 곳곳에 사자상을 설치한 이탈리아 베니스 등 유럽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뜬금없이 사자 얼굴이 대구 곳곳 골목 대문에 새겨진 연유는 무엇일까. 대문 제작업소 몇 곳을 찾아가 물어봤지만 도무지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다만 사자 문고리 디자인이 1970, 80년대 전후로 골목길 곳곳 대문 디자인으로 유행처럼 보급됐다는 사실 밖에는. 이 시기는 사자 문고리 외에도 유럽에서 건너온 다양한 문양이 양옥 주택 보급과 함께 퍼진 때이기도 하다.
사실 동서양 할 것 없이 험상궂은 얼굴을 가졌거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고 무서운 소리를 내는 상징물을 출입구에 설치했다. 중국에서는 기괴한 얼굴을 한 '제마'를 문 위에 설치해 악귀를 막고자 했다. 유럽에서는 상반신은 독수리이고 하반신은 사자인 그리스 신화 속 괴물 '그리핀'을 경계의 상징으로 문에 새겼다. '장식의 8천 년'의 저자이며 세계 곳곳 문양을 수집한 학자 에바 윌슨은 "짐승 이야기는 대중의 사상과 문학뿐 아니라 모든 장식 미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대문에 새겨진 짐승 장식도 마찬가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침입자를 살피는 CC(폐쇄회로)TV가 흔해졌고, 단순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문을 선호하는 요즘, 집과 가족을 지켜주던 수문장 짐승들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글 사진 황희진 기자 hhj@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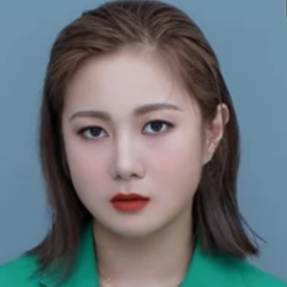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국민께 깊이 사과" [영상]
배현진, 故안성기 장례식장 흰 옷 입고 조문…복장·태도 논란
李대통령 "이제 중국 미세먼지 걱정 거의 안 해…엄청난 발전"
[단독] 정부 위원회 수장이 '마두로 석방 시위' 참가
무안공항→김대중공항... "우상화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