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불안석이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팽개치고 달려가고 싶지만 매인 몸이라 그럴 수 없다. 애가 탄다.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가로수처럼 그렇게도 빨리 지나가던 시간이 거북 걸음보다 더 느리다. 배가 아프다고 작은아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프기에 전화까지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돌도 씹어 삼킬 혈기왕성할 20대가 아니던가. 병원에 가지 않고 뭘 했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끙끙 앓는 소리만 들려온다.
퇴근하고 오니 새우처럼 웅크리고 자고 있다. 전역했으니 홀가분한 마음에 포동포동 살이 올라야 할 얼굴인데 피골이 상접하다. 마음이 짠하다. 조심스럽게 깨워 병원에 가자고 하니 견딜 만하다며 내일 가잔다. 지켜보다 깜빡 졸았는가보다. 끙끙 앓는 소리에 일어나니 시계는 자정을 지나고 있다. 아이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으면 짊어지고 싶었다. 응급실 문을 두드렸다. 북새통이 따로 없다.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한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결과를 기다리자면 두어 시간은 또 기다려야 한단다.
아이는 입대하기 전에도 식구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징병 신체검사 하러 갔다가 간 수치가 520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재검하니 반나절 만에 590이다. 위험 수치란다. 이삼일 전부터 누워 있는 시간이 많더니 몸이 개운치 않아 그런 줄도 모르고 타박만 했었다. 아이는 시들어가는 꽃 같았다. 저러다 친구의 아이처럼, 동백꽃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모든 걸 팽개치고 대학병원으로 한의원으로 미친년 널뛰듯 쫓아다녔다. 힘이 없어 축 늘어진 아이를 보는 것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렇게 애간장을 태운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국방의 의무까지 다하고 왔는데 또 아프단다. 동네병원에서 급성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맹장염은 몹쓸 병이 아니라 수술만 하면 괜찮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파하는 그 모습을 오롯이 지켜봐야 하는 나로서는 괜찮지 않았다.
근종수술을 한다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이틀이 멀다 하고 안부 전화하는 어머니에게 걱정을 얹어 드릴 수 없어 사나흘 여행 다녀오겠다고 하고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괜찮냐?"라는 말 대신에 "넌, 어미도 없는 고아냐, 어미가 얼마나 신통찮았으면 몸에 칼을 대는데 연락을 안 했느냐"며 서운해 하셨다. 힘들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던가. 옆에만 계셔도 힘이 되는 사람이다. 수술실 앞에서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취에서 깨어난 아이는 아픔을 호소한다. 낫기 위한 수순인데도 아프다니 또 마음이 아프다. 어미에게 있어서 자식은 언제나 아픈 손가락인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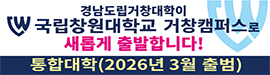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