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주변에서 민간인 지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외국인 근로자까지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었다.
6·25전쟁 이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지뢰를 무더기로 매설하고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에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것이다. 지뢰는 그동안 약 100만발 묻혔고, 매설 면적은 여의도의 33배 수준이다.
군 당국은 민간인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 등을 설치했을 뿐 인명피해를 막는 데 매우 소홀하다. 희생자들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배상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다.
◇ 외국인 첫 지뢰 피해자 발생…"국내 피해자 수도 몰라"
지난 4일 낮 12시 54분께 강원 양구군 해안면 현리의 인삼밭 인근 개울.
농장에서 일하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근로자 A(54)씨는 잠시 개울에 들어갔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가 일하는 지역은 평소에도 주민이 농사일 하러 다니는 곳이었다. 전방 지역이지만 출입을 통제하거나 지뢰가 매설돼 있다는 경고문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한 주민은 "개울 쪽에서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발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주민은 "여기는 지뢰를 매설한 곳이 아니니까 아마 장마철에 산에서 떠내려 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카자흐스탄 출신 근로자는 119구급대원 등에 의해 응급 치료를 받고 나서 소방헬기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무비자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해 이곳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 해안면의 민간인 지뢰 사고는 6·25전쟁의 포성이 멎으면서 시작됐다.
2009년 10월에는 해안면 현3리 일명 가칠봉 인근에서 약초를 캐던 김모(53) 씨가 발목 지뢰가 폭발해 크게 다쳤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약초를 캐던 중 미확인 지뢰 지대에서 발목 지뢰를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앞서 2002년 6월에는 해안면 만대리에서 밭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모(43) 씨가 대전차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터져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지뢰 사고로 민간인이 국내에서 얼마나 다치거나 숨졌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가 차원의 민간인 지뢰 피해자 전수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서 외부에 알려진 사고를 통해서만 피해자 현황을 짐작할 뿐이다.
국내 민간인 지뢰 사고는 2015년 1건(1명), 2014년 3건(9명), 2013년 1건(1명), 2012년 1건(1명), 2011년 1건(1명), 2010년 2건(3명) 등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강원도의 의뢰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강원도 내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2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16명은 현장에서 숨졌다.
또 다른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피해자와 지뢰 사고 이후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진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450∼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뢰 피해자 지원단체는 국가 차원의 민간인 지뢰 피해자 전수조사를 촉구해 왔지만, 당국은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 외국인도 지뢰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 듯
법조계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뢰를 매설해 관리하는 위험물 관리주체로서 국가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가가 위험물 관리를 어느 정도 했느냐에 따라 과실 정도가 달라지지만 그동안 소송을 제기한 상당수 내국인 피해자는 배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뢰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다섭 변호사는 "외국인이 지뢰사고를 당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지뢰사고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를 불문하고 위험물 관리주체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도 지뢰를 알고도 일부러 밟은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외국인 대상 지뢰 특별교육 시급"
6·25전쟁 이후 비무장지대(DMZ)와 인근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에 매설한 지뢰는 100만발로 알려졌다.
지뢰를 매설한 면적은 여의도 면적(윤중로제방 안쪽 2.9㎢)의 33배인 97㎢에 이른다.
지뢰 매설과 관리는 군 당국이 맡고 있다. 최전방 마을이나 농경지 주변에 군 작전 차원에서 매설한 계획지뢰지대에는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지뢰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지뢰를 매설하고 나서도 당국이 애초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장마철에 지뢰가 유실된 경우다.
지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고 당시는 출입통제를 위한 철조망이나 안내문이 없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가보니 철조망 등을 처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지뢰 사고를 당한 주민은 병원으로 갑자기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수많은 지뢰 사고를 통해 지뢰 위험지역을 아는 주민에 비해 요즘 접경지역에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본격적 영농철을 맞은 양구, 철원군 휴전선 지역은 요즘 젊은이가 없어 마을별로 수십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농사일을 거들고 있다.
실제로 철원의 한 마을은 180가구 중 30명이 외국인 근로자일 정도다.
조재국 평화나눔회 이사장은 "군 당국은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지뢰가 하늘에서 떨어졌을지는 없는 만큼 그곳이 과거에 지뢰 지대였거나 떠내려왔을 위험성 등에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로 와서 일하는 외국인은 옛날에 사고가 났다는 얘기도 잘 모르고, 어디가 지뢰 지대인지 모를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지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교육이나 홍보가 전혀 안돼 있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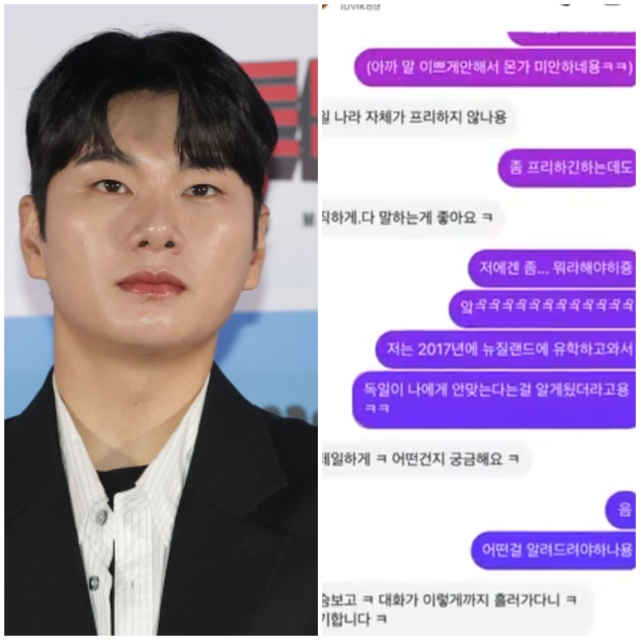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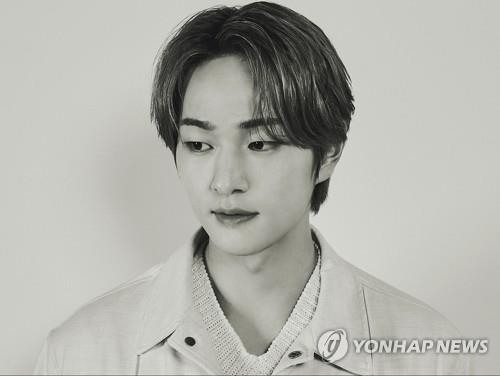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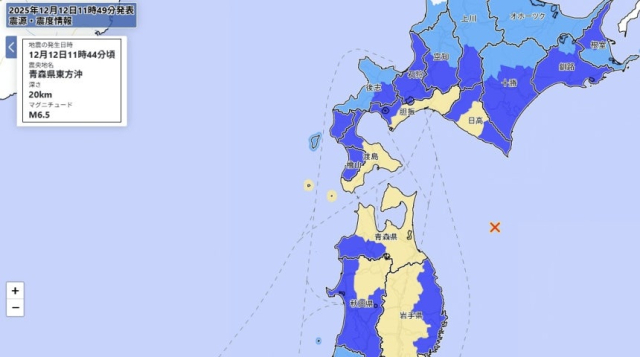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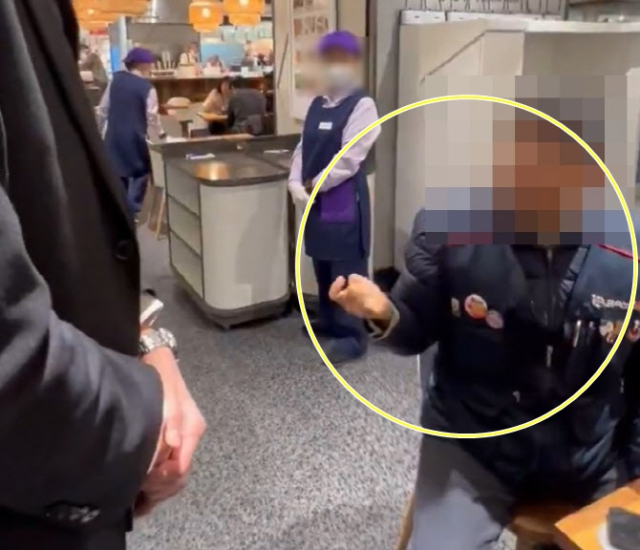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