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아동을 장기간 보호해야 하는 시설들이 법적 뒷받침 부족으로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가 힘들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 보호하고 있으나 친권은 여전히 부모가 가지고 있어 사사건건 가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나 휴대전화, 통장 개설에도 동의가 필요하다. 가해자와 격리해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 입장에서 매번 학대 부모를 만나거나 우편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의 역할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2014년 학대 피해 아동 보호 건수는 1만27건으로 1만 건을 넘었다. 그 전해 6천796건에 비해 48%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수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정돼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수만 다룬 것이다.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가해자 중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피해 신고가 늘고 보호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03년 19곳이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지난해 55곳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졌음에도 법적 권한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양육 시설은 학대 수준이 심각하고 6개월이 넘도록 부모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장기간 아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곳이지만 부모를 대신할 권한은 없다. 가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을수록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이를 위해 가해자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라면 자격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격리가 필요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여전히 가해자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제도는 후진적이다. 학대 부모에게는 아이를 학대하는 순간 친권이 사라진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한다. 아동학대를 확인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친권 행사를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크다. 보호기관이 이를 대신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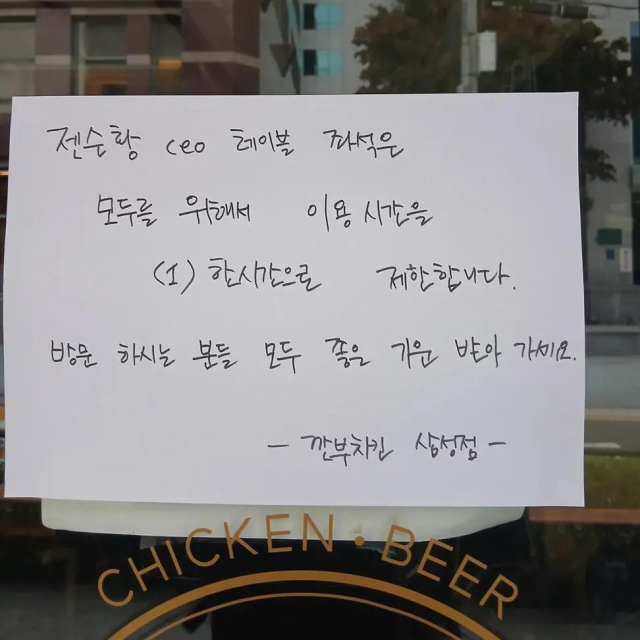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