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세 철학자들의 활동 시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는 물음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답을 맞힐 수 있을까. 대기업 입사 시험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고 하는데, 지원자의 인문학적 소양을 가늠해보려는 의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정답을 맞혔다고 해서 과연 인문학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출제 의도가 암기력 측정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 그러한 철학적 사유가 그 시대를 지배했는지에 대해 지원자마다 정립해놓은 생각이 정답으로 이어지길 바랐을 것이다.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공부로 기출문제를 푸는 벼락치기 스터디에 들어 '정답 찾기'에 몰두한다고 하니 아이러니다. 적어도 인문학의 근간인 주체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창의적 인재상이 되고자 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다닐 때 동양고전 강독 모임을 한 적이 있다. 고(故)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을 교재로 공부했다. 저자가 학생운동으로 감옥 생활을 할 당시 교도소 규정상 책 세 권 이상을 소지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 권을 가지고 오래 읽을 수 있는 동양 고전을 선택했단다. 그렇게 동양 고전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꽤 현실적인 이유다. 고전 읽기 모임은 그 후로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나는 다른 의미에서 고전 읽기의 이유가 현실적이었다. 취업 준비가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인문학 공부는 과연 고전 읽기일까. 인문학은 문자 그대로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문학, 역사, 철학, 언어, 예술, 종교처럼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고전으로 인문학을 연구하려는 흐름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부활이 목표였고 따라서 학문의 목표는 그리스 고전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인문학 공부가 오늘날 고전 읽기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4세기의 인문학이 고전을 통한 연구였을지라도 인간의 모든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듯이, 꼭 인문학 공부가 고전 읽기로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해가 어려운 고전을 굳이 의무감으로 다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명언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생각하고 그 문장이 주는 무게감을 내 생활과 연결시켜본다면, 그것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트렌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은 유행을 떠나 현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인문학 공부는 공연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연장에서 공연만 한다는 편견을 깨는 것부터가 인문학적 사고의 출발일 수 있다. 대극장에서 서로 소통하며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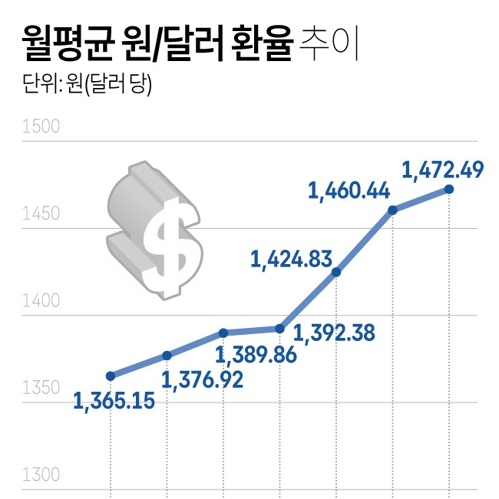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나경원 "李대통령, 전 부처 돌며 '망언 콘서트'…연막작전쇼"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