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이 북한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오늘 열리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 김여정은 김정은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인물이다. 그런 김여정을 김정은이 보낸 데는 야심 찬 정치적 복선(伏線)이 깔렸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십중팔구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전환한다는 구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호응이 꼭 필요하다. 이는 성공적이다. 북한이 요구하지 않아도 문 정부가 알아서 북한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정치쇼'일 수밖에 없는 각종 부대행사 개최의 걸림돌이 되는 국내외의 각종 제재에 '예외'라는 구멍을 뚫어 무력화시켰다. 평양 열병식에 대해서도 꿀 먹은 벙어리였다. 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에 대해서도 말을 흐린다. 이낙연 총리는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전술에 문 정부가 자발적으로 말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제의 이후 지금까지 남북 당국 간 접촉에서 '북핵'이란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문 정부는 '핵'에 대해 입을 닫은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의 분위기는 평창올림픽으로 만사가 해결되는 듯이 잔뜩 부풀어 있다. 김여정의 방남에 이르러서는 더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여정 면담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올림픽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란 현실적인 근거는 없다. 정상화의 대전제는 핵 폐기이고 그것도 '조건 없는'이란 전제가 붙어야 한다. 핵 동결 제스처와 보상이 짝을 이뤄 반복해온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와 관련해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권은 정상회담이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접고 올림픽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김정은은 친동생까지 보냈으니 남한은 보답하라며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군사훈련 무기 중단 등 값비싼 청구서를 들이밀 것이다. 지금은 값싼 민족 감정에 사로잡혀 현실을 낭만적으로 바라볼 때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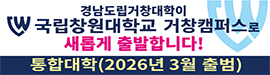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