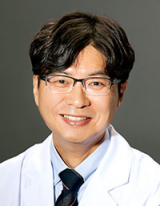
8년 전 봄, 코피가 난다며 중3 여학생이 진료실을 찾아왔다. 콧속에 커다란 혹이 보여 조직 검사를 했다. 결과는 안타깝게도 '연골육종'이라는 악성종양이었다. '암'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환자에게 전하는 일은 매번 힘겹다.
"며칠 동안 마음 졸이셨지요? 놀라지 말고 들어보세요. 안타깝게도 검사 결과는 암입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병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아이의 암 선고에 어머니는 진료실에 주저앉았고, 학생의 볼에는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딸아이 몰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우리 딸 살 수 있는 거 맞지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의사는 '암'을 말하지만, 암 환자들은 이처럼 '죽음'을 먼저 떠올린다.
우리는 암세포와 늘 함께 산다. 하루 수천 개의 암세포가 몸에 생기지만 면역세포가 찾아내 파괴한다. 하지만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수십억, 수백억 개로 불어나 마침내 '암'이 된다.
암은 흔한 병이다. 한국인이 기대 수명인 82세까지 산다면 세 명 중 한 명은 암에 걸린다. 그리고 암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다. 지금도 암 환자 10명 중 7명이 5년 이상 생존하고, 암 환자의 절반은 완치되고 있다. 그런데도 암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암을 말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암과 멀리 있고 싶어 한다.
얼마 전 한 가족이 음식점에 갔다가 할머니가 암 환자라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한 40대 남성은 항공사 채용에 응시해 서류와 면접시험은 통과했으나, 4년 전 방광암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탈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암 환자들은 병마와 싸우는 동시에 사회적 편견과도 싸우고 있다. 2012년 '정신종양학회지'의 '암과 암 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 연구'를 보면 응답자의 71.8%가 '암 환자는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없다'고 답했고, '암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42.3%나 됐다.
암 환자들은 이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더 아파한다. 삶의 한고비를 넘기고 용기를 내 우리 곁으로 돌아온 그들이 바라는 건 소박하다. 아픈 사람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처럼 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잠시 떠나온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암 완치 판정을 받은 여중생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 직장을 다니며 1년에 한 번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는다. 오래전, 퇴원을 앞둔 어느 날 저녁 회진을 갔던 기억이 난다. 병실에 들어서니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환자와 둘러앉아 도시락과 병원 밥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었다. '까르르, 까르르' 웃음소리 가득한 병실을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암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진심 어린 위로가 어떤 것인지 어린 학생들이 '형식적인 회진'을 온 의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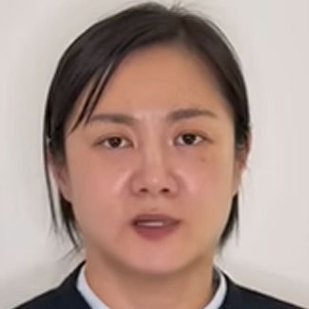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