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두 갑
육봉수(1957~2013)
형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형편 낫지 않겠습니까?
인력시장 일당 오만 원에 팔려
비계 파이프 정리하던
건설현장에서 만난 십몇 년 전 함께
해고 됐던 옛 동지 슬그머니
호주머니 속으로 찔러 넣어주는
심플 담배 두 갑,
서럽지도 않은데 글썽
눈물 같은 게 돌아
이놈의 이
빌어먹을 놈의 먼지들
육영수 여사 그리고 사진작가 육명심 선생, 내가 이름이라도 아는 육씨 성 가진 사람의 전부다. 그러다 어느 날 육봉수 시인이 추가되었다. 나보다도 더 완전 생짜 날것! 그의 시들은 건강해도 보통 건강한 게 아니었다. 언젠가 연이 닿아 술 한잔 나눌 기회가 생기면 "아이구 형님!" 저절로 내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갈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육봉수 시인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 뇌출혈로 죽었다.
세상을 살아가니 나에게도 어쩌다 택배란 게 오긴 오는데, 얼마 전 택배 땜에 식겁했다. 외출을 했다 돌아오는데 저만치 택배차가 서 있었다. 그리고 아는 얼굴 하나가 짐을 내리고 있었다. 한눈에 딱 봐도 ○○○이었다. 아하, 하다 하다 택배 일을 하는구나! 묻지 않고 듣지 않아도 ○○○의 그간의 일들을 알 만했다. 그는 망해 버린 공장, 내 직장 동료였다. 나는 그가 일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숨어 지켜보기만 했다. 모르겠다. 내가 왜 그를 피했는지….
좌우지간, 공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담배 끊어라 하지 마라! 이것이 솔직한 내 심정이다. 오래 살아 득될 것도 없는 세상, 담배라도 한 대 세게 빨아야 죽지 않고 살 거 아니가. 길이가 길고 두껍고 빨리 타지 않는 '심플'은 노동자 시인 육봉수한테 어울리던 담배. 흰 구름 흘러가는 가을이 오면 구미 선산 어디께 육봉수 시인의 무덤 앞에 앉아 나도 길게 두껍게 심플 한 대를 태우고 싶다. 참말로, 공장엘 다니면서, 시 같은 걸 쓰는 건 아니었다.

시인 유홍준:1998년 『시와반시』로 등단. 시집 『喪家에 모인 구두들』 『나는, 웃는다』 『저녁의 슬하』 『북천-까마귀』 『너의 이름을 모른다는 건 축복』이 있다. 시작문학상 이형기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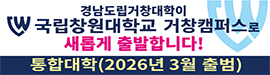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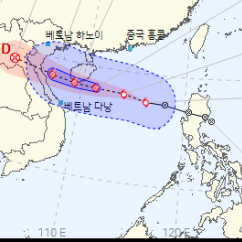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