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연구에서 인용자료나 사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학문적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문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이본에 대한 서지사항을 먼저 파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북대 남권희교수(문헌정보학)와 금오공대 금석배교수(국문학)는 28일 이대학 인문대에서 열린 문학과 언어연구회 후기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서지학일반및 문헌자료의 연대추정법}과 {고소설 이본 연구상의 여러문제}에 대해각각 발표, 연구자들이 사료나 자료에 대한 교감(교감)작업을 빠뜨린채 편의성을 좇아 일부 판본이나 이본만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풍토는 지양돼야한다고강조했다.
남교수는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조차 개인소장본의 경우 판본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국학 연구의 걸림돌로 작용하며, 일부에서는 고서간기를 조작하는사례까지 있어 국학연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고문헌이나 희귀서에 대한서지작업이 기초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초기의 대표적 시비평인 서거정의 {동인시화}는 {동인시화초판본}(1477) {초판후쇄본} {개간본}(1639)등 7종 20여종 넘게 전해오고 있으나 판본간 내용변화나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양성지 발문이 잘못 영인된 중간본을 인용사료로 삼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국문학 논문이 수십편에 이른다고 밝혔다.한편 김석배교수는 흔히 다양한 이본중에서 최선본을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삼는 연구 경향이 있어왔지만 개별이본의 문학적 성과를 따지기 전에 반드시이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작품의 생성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본은 거의 없고 간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대부분 생성연대가 아니라 생산연대(정착연대)일뿐이라고 지적하고, 한남서림에서 간행한 소위 한남본에 붙어있는 판권지의 연대를 생산연대로 신뢰할수 없다고 밝혔다. 춘향전의 경우 1940년대 이전의 이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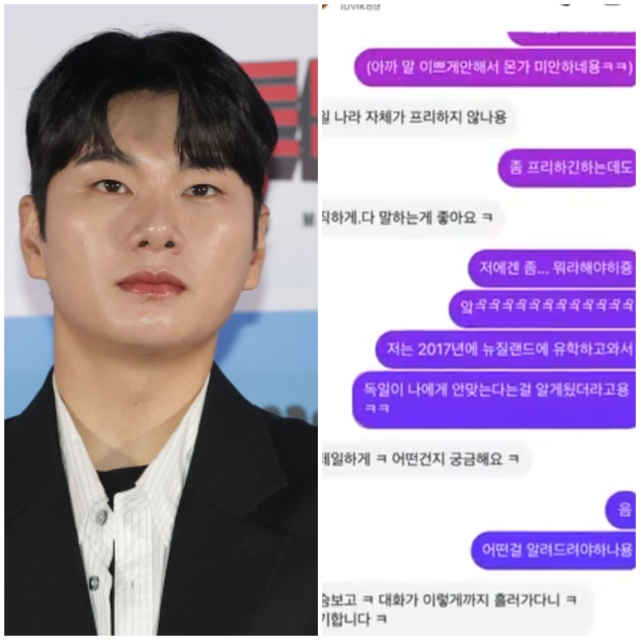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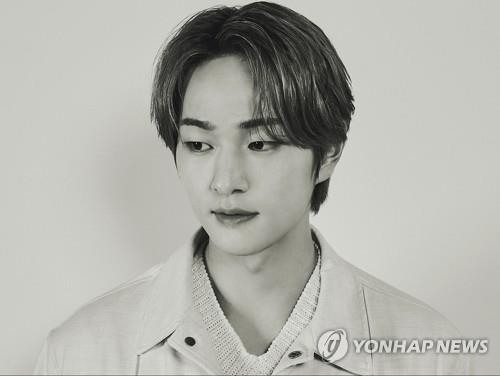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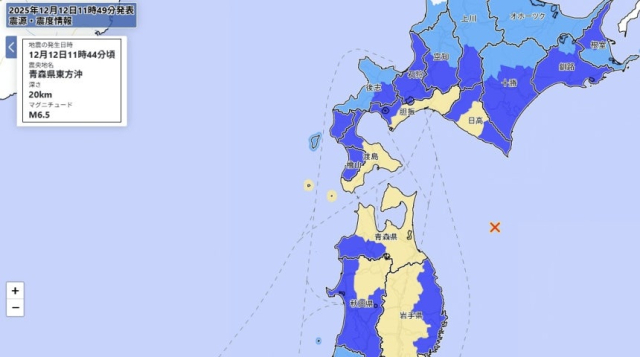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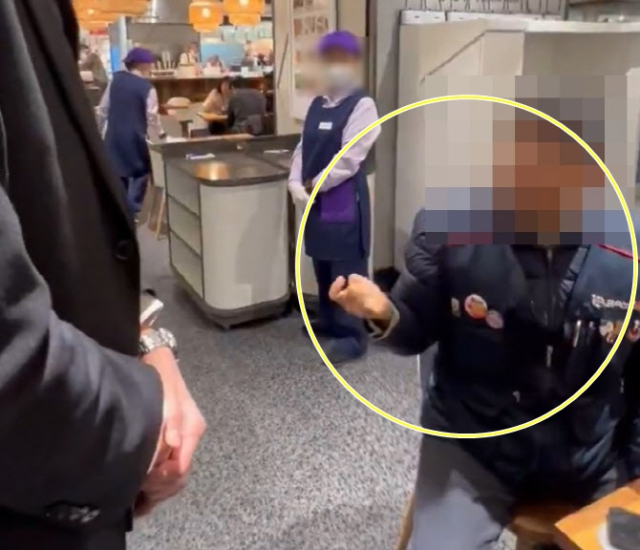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통일교 측 "전재수에게 4천만원·명품시계 2개 줘"…전재수 "사실 아냐"
"안귀령 총구 탈취? 화장하고 준비" 김현태 前707단장 법정증언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