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결혼을 한 새 신부가 집들이를 한다고 손님을 불렀다.
전을 지지고 맛있는 국을 끓이기 위해 간도 열심히 봤다.
식탁 위에 차려 놓은 진수성찬에 모두들 군침을 흘렸는데 막상 숟가락을 들고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신부가 한 숟가락 먹어보지만 끓일 때 맛과는 달리 너무 짜다.
신혼집 집들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능숙한 주부라면 한 두 숟가락 정도만 맛을 보아도 정확히 간을 맞추지만 새 신부는 두 배, 세 배로 국을 떠 먹어보고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
왜 그럴까?
통계적 입장에서 살펴보자. 이는 표본 추출의 문제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모든 종류의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표본 추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의 간을 보는 일상의 행동에 빗대어 풀이해보자.
국의 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국 한 솥이 전체라면 간을 보기 위해 국 한 솥을 대신해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보는 만큼이 전체를 나타내는 표본이 된다.
여기서 한 두 숟가락 뜨는 행위가 바로 표본 추출이 된다.
국의 간을 보기 위해 국 한 솥(전체)을 다 먹어 볼 수는 없다.
끓는 상태에서 소금간을 하고 골고루 섞은 다음 한 숟가락을 떠서 약간 식힌 후에 간을 보아야 한다.
즉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금을 넣은 후 완전히 끓지도 않은 상태, 혹은 완전히 끓었더라도 골고루 섞이도록 젓지 않은 상태이거나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한 숟가락 떠 먹어보는 것은 국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없다.
새 신부가 국의 간을 잘 맞추지 못하는 까닭도 바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였기 때문.
추출한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개수가 되고 추출하는 방법이 적절하기만 하다면 이 표본은 전체를 대표할 것이다.
만약 표본이 이러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면 차라리 눈짐작 쪽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통계 정보를 신문과 TV, 라디오를 통해 접한다.
통계는 수학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열쇠를 갖기 위해서는 통계 조사 결과를 대할 때 비판적인 안목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주필남(수성초등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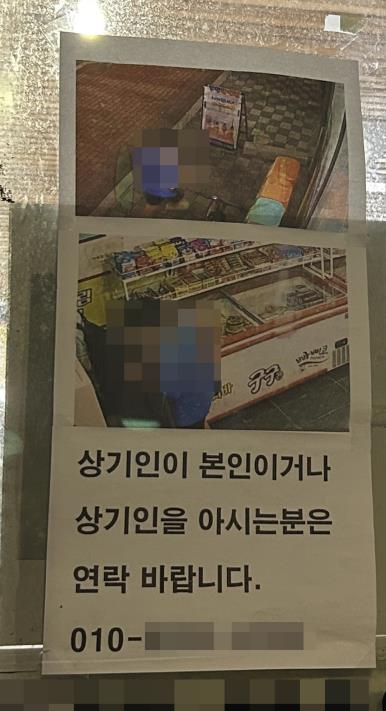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