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꽃이 만발하는 새봄이 돌아왔다. 대구는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 그런지 비교적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해왔다. 우선 대도시임에도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공기가 아주 깨끗한 편이고, 도로가 바둑판처럼 잘 닦여 있어 이만한 곳도 없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정이 좀 달라서 대구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니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 유치하고, 나아가 타 지역의 사람들까지 스스로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대구를 먹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있어서는 고용창출 효과와 산업연관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1.5배 이상 월등히 높은 건설업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건설업의 경우 주택건설 위주로 1990년대에 크게 성장했는데 청구·우방·보성·화성·서한·대백 등의 지역업체들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 아파트 단지 건설에 왕성하게 참여해 1997년도에는 전국 건설산업의 5% 이상을 차지, 서울·경기에 이어 3위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IMF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급작스러운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 8년째 침체일로에 있다. 작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13위에 머물렀고, 대구의 시세도 서울·부산 다음인 3위 자리를 인천에 빼앗긴지도 6년이 지났다.
주택건설산업은 토지매입 등으로 자금의 선투입이 막대하여 금융권의 부채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괘심죄(?)에 걸려 금융권의 자금을 원활히 동원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런 주변사정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게되면 자산이 많은 상태에서도 존립의 기로에 서게되는 것이다.
여러 사정으로 매출이 가장 많았던 청구(97년)에 이어 보성·대백·우방·서한이 줄줄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그후 이들 업체들은 어려운 여건속에 명맥을 유지해 오면서 회생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래서 2003년에는 서한과 대백건설, 지난해에는 우방, 올해는 청구가 마침내 새 주인을 맞이해 다시금 의욕적으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달들어 대구·경북이 스스로 지역경제 공동발전과 상생번영을 위해 대구·경북 경제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올 봄에는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영정상화에 이어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이 자전거의 앞·뒤 바퀴에 가속을 붙이는 역할을 해서 대구·경북이 옛 명성을 되찾고 대구를 떠난 사람들이 회귀하는 기틀을 다지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광영(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사무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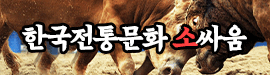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