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년 당시 마을 도로는 물론 지방도로 마저 너무 비좁고 꼬불꼬불해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특히 마을 어구의 강과 소하천에 물이 넘쳐나면서 갓 보급되기 시작한 동력경운기마저 맘놓고 다닐 수 없는 지경이었다.
때마침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을 하천의 다리가 바뀌기 시작했다. 큰돌로 만든 징검다리나 통나무를 벌목해 만든 외나무다리,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아르방(구멍이 여러개 뚫힌 철판)으로 만든 철판다리가 시멘트와 철골을 이용한 콘크리트 교량으로 속속 바뀌기 시작한 것. 1971~75년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든 다리는 전국에서 모두 6만5천개. 마을당 평균 2개의 다리가 만들어 진 셈이다.
당시 경북 최대 규모의 새마을다리는 고령 우곡면 도진리 마을앞 회천의 도진교로 길이가 200m나 됐다. 비만오면 불어난 물때문에 도진리를 비롯 대곡1·2, 사전, 야정1·2, 속리 등 7개 마을 주민들은 배를 타고 건너 반대편의 논밭에서 농사를 지어야 했고 우기에는 아예 외지 출입을 할 수 없었다. 불편이 컸던 만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자 마자 교량건설 추진위를 구성, 정부로부터 시멘트 3천포대와 철근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420 가구 농민들이 총동원돼 꼬박 1년 만에 준공했지만 어느 주민도 불평하지 않았다. 비만오면 결석이나 조퇴를 해야했던 자녀들의 전천후 등교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농산물 운송으로 농가소득 증대의 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기대때문이었다.
도진리 박태홍(65) 씨는 "도진교를 건설하는 데 꼬박 1년이 걸렸으며, 준공때는 강가 뱃사장에서 '군씨름대회'를 열어 자축했을 정도로 큰 일이었다."며 "남녀노소할 것 없이 하루종인 모래·자갈을 이고 날라 시멘트와 섞어 다릿발 하나를 겨우 세웠다."고 말했다. 우곡면 최윤기(58) 총무담당은 "당시 철근과 시멘트 3천 포대 외에 3천만 원이 지원됐을뿐 나머지는 모두 주민들의 노동력으로 해결했다."며 "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같은 애환과 추억을 담은 도진교는 1980년대 들면서 대형 트럭, 버스 등 고하중 차량 통행량 증가와 노후화 등 세파에 찌들려 주저앉았다. 현재는 1994년 새로 건설한 다리로 교체됐다.
청송 진보면 진안리~광덕리간 광덕교도 대표적인 새마을교량이다. 1969년 착공했지만 공사비가 모자라 몇년째 공사가 중단됐다가 6년만인 1974년에야 길이 200m, 폭 3m 규모로 준공했다. 수혜마을로 240가구였던 광덕리 및 세장리는 시멘트와 철근은 군의 지원을 받았지만 공사비중 일부를 갹출해 부담하고(350여만 원 중 120만 원), 하루 삼교대로 밤낮 없이 부역을 했다. 주민들은 금반지, 가을 추수 벼를 내놓았지만 그래도 모자라 30만 원어치는 준공식때 주민들의 박수소리로 대신하기도 했다.
진보면 권영식(54) 부면장은 "당시 군 복무중이었는데 휴가때 광덕교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당시 새마을지도자였던 권오덕(73) 씨는 "콘크리트 다리를 만들기 전에는 나무로 엮어 만든 섶다리였는데 일년에 3번쯤 떠내려갔다."며 "이를 대비해 봄철 겉보리 40㎏, 가을 벼 40㎏을 삯으로 사공에게 주고 학생들을 나룻배로 실어날랐다."고 말했다.
1971년 1월 착공, 8월에 완공된 의성 비안면 장춘2리 앞 위천 철판다리는 길이 192m, 폭 4m의 콘크리트 교량으로 1971년 초 무렵 경북에서 가진 긴 새마을다리로 손꼽혔다. 장춘교 건설추진위원회 감사를 맡았던 이상천(79) 씨는 "겨울밤 횃불을 환하게 밝혀 놓고 시멘트와 모래·자갈을 운반하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주민들은 당시 정부교부세 1천만 원과 군 지원금 400만 원으로 공사를 하다 모자랐지만 쌍마섬유 김복유(작고) 회장이 2천4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지원해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당시 이장 이상조(74) 씨는 "80여 가구마다 다리건설 부담금과 30일간의 부역이 할당됐으며, 형편이 어려운 집은 부역으로 부담금을 대신하기도 했다."고 했으며 질통으로 모래와 자갈을 날랐다는 김창수(70) 씨는 "이장이 반별 조를 편성, 질통부대를 만들었는 데 질통을 지고 하루 100번 정도 교각 위를 오르내리는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다리는 2004년 6월 집중호우에 유실돼 지난해 9월 50m 상류 지점에 다른 다리가 만들어졌고 다리 이름도 '장춘교' 대신 '장송교'로 붙여지면서 새마을 다리는 사라지고 말았다.
1971~78년 새마을사업에 정부가 전국 마을단위별로 지원한 시멘트는 평균 2천100포대(40kg들이, 84t)였고, 철골은 2.6t이었다. 74년 시가로 환산하면 마을당 연간 250만 원 상당이 해마다 지원된 것이다. 한마을을 평균 100가구로 볼때 가구당 2만5천원 선으로 농촌의 얼굴을 확 바꿀만한 돈이 아니었지만 개별가구 지원이 아닌 마을당 지원으로 주민 협동과 자조정신을 불러일으킨 결과 농촌 근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이 시멘트와 철골의 위력은 바로 농촌의 교량 건설에서 처음으로 입증된 것이다.
황재성·박용우·김경돈·이희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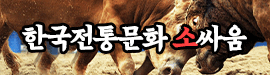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성추행 호소하자 2차 가해, 조국은 침묵"…강미정, 혁신당 탈당
7년 만에 악수 나눈 우원식·김정은…李대통령, 禹 통해 전한 메시지는?
우원식 "김정은과 악수한 것 자체가 성과"…방중일정 자평
[단독] "TK통합신공항 사업명 바꾸자"…TK 정치권서 목소리
고개 숙인 조국혁신당 "성비위 재발 막겠다…피해회복 끝까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