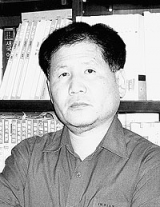
시절은 바야흐로 오곡이 黃雲(황운)을 이루는 重陽節(중양절)이라, 자고로 이때는 향기로운 술을 등에 지고 높은 언덕에 올라 풍년을 노래하던 풍습이 있었다. 이에 벽촌의 愚夫(우부)도 잡았던 쇠스랑을 잠시 놓고 단장에 기대어 歸正臺(귀정대)에 오른다. 봉두에 급히 올라 국화주 한잔 부어 장쾌한 휘파람을 뽐내려 하였더니 스산한 바람이 소매 끝에 몰아치고, 산 아래 저 세상은 안개 가득 싸여 있다.
수상하다. 참으로 수상하다. 촌부가 어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헤아릴까마는 도처에 난무하는 거짓들이 수상하다. 사람 끓는 세상이야 무시로 속고 속이는 일이 있으나 이처럼 흉흉한 건 예사가 아니다. 눈을 들어 앞을 보면 얽히고 꼬인 실타래가 어느 시궁창으로 뻗었는지 시종을 알 수 없고, 눈을 돌려 뒤를 보면 갈라지고 흩어진 민심을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편작이 온다 한들 어쩔 도리가 없겠다.
모두가 같지 않음 탓이다. 君(군)이 君(군)답지 않음이요, 臣(신)이 臣(신)답지 않음이요, 民(민)이 民(민)답지 않음이다. 君은 아비라 하였으니 民이 君을 세웠으면 지엄하게 자중하여 일월처럼 광명을 온 누리에 쏟아야 하거늘 얕은 입이 열릴 때마다 비바람이 몰아쳐 배가 산에 걸리고, 굳은 땅은 뒤집어져 진땅이 되는가 하면 사람들은 떼를 지어 머리를 들고 혀를 찬다.
臣은 어미라 하여 君이 臣에게 명을 주었으면 오매불망 民의 위무에 골몰해야 하거늘 빈한했던 舊怨(구원)에 목이 말라 오만하게 다리를 꼬고 방자하게 수염을 매만지며 승냥이처럼 어슬렁거리니 어찌 君의 덕을 돕고 民의 이익을 도모한다 하겠는가.
어리석고 가련한 건 民이로다. 民福(민복)은 상현달과 같아서 은근히 배가 불러오고 등겨불로 온돌을 데우듯 서서히 등이 따사로워지는 법이거늘, 당장에 한술 밥을 찾겠다고 너나없이 독기를 품고 창칼 같은 입을 앞세워 죽기로 나서니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고 하는 일과 무엇이 다르랴. 배가 고파 고기를 얻자 하면 그물 끝을 나눠 잡고 물속이 명징하도록 오래도록 버틸 일이지, 서로가 발길질로 바탕을 흐려놓고 네 탓부터 일삼으니 이보다 더한 자중지란이 어디에 있을까.
참으로 가관이다. 풍랑 만난 배는 갈 길이 천리인데, 노를 잃고 돛대는 끊어지고 물결은 드높아 안개 자욱하여 날은 거머둑 어두워진다. 사방에서는 이민족들이 호시탐탐 목덜미를 노리고 손을 들어 업신여기는데 하는 짓들이 가관이다.
애초에 군을 세울 때에 무변광대한 능력을 바랐을까. 환술 같은 바람이 구태를 날리고 民의 어깨를 감동으로 안아줄 것으로 믿었으되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뜻이 아득하여 한숨만 늘 뿐이다. 逆天者(역천자)는 亡(망)이요 順天者(순천자)는 興(흥)이라 함은 순리를 두고 이름이다.
자고로 만사가 순리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던가. 어리석은 촌부도 비가 오면 전답의 물고를 틀 줄 알고, 날이 마르면 둑을 막아 물을 가둘 줄 안다. 바야흐로 나라를 이끄는 자는 혼탁한 시국의 중심에 서서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진심으로 가슴을 열어 보여 民으로부터 박수를 구할 때다.
君이 君답지 못하고 臣이 臣답지 못하면 때로는 民이 어버이가 되어 힘을 모아 주는 예가 허다했다. 대명천지 꼼수 위에 민심이 있거늘 아집으로 이를 물고 民을 대적함은 어리석은 역리이다. 시절은 언제나 하수상한 법이나 이즈음의 세상은 어지럽기 그지없다.
작금의 어려움을 넘기지 못한다면 다같이 쓰러지는 외길만이 있을 뿐이요, 저 홀로 따로 사는 길은 애초에 없을 터다. 부디 君은 君답고 臣은 臣답고 民은 民다워서 모두 함께 귀정대에 손잡고 올라 국화주 높이 들고 풍년가 장단에 허벅지를 두드리며 흥에 취할 날을 고대한다.
홍억선 수필가·계간 '수필세계' 주간






































댓글 많은 뉴스
'절윤' 거부에 폭발… 국힘 25인, 장동혁 사퇴 촉구 "민심 거스른 독단"
국민의힘 새 당명 유력 후보 '미래연대'·'미래를여는공화당'
李대통령 "친일·매국하면 3대가 흥한다고…이제 모든 것 제자리로"
'尹사면 차단' 사면법 개정안, 국힘 반발 속 법사소위 통과
'코스피 5800 돌파' 李대통령 지지율 58.2%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