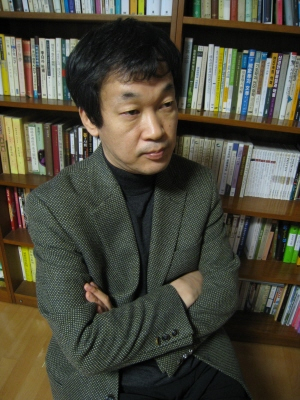
노태맹의 시는 어렵다. 그의 시를 읽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한다. 그렇다고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노태맹은 "내가 독자의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다. 독자 역시 내 시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마주침이다. 독자와 내 시가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보듯 내 시를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시가 무엇을 이야기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밑줄 긋기 교육이 빚어낸 착각이라고 했다. 자신에게 시는 유물론적 허구이며 자신은 다만 그 안에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려고 노력할 뿐이라고 했다.
노태맹은 '대중성'을 염두에 둔 시들이 장르를 파괴하고 시를 그렇고 그런 잠언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그렇다고 시가 대중성을 거스르는 고고한 무엇이라는 말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는 틀림없이 대중이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이지만 노태맹 자신이 대중의 사랑을 얻으려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었다.
시가 무엇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시를 하나의 상황으로 읽어달라고 했다. 그의 두 번째 시집 '푸른 염소를 부르다'의 표제 역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그를 부르는가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통, 욕구, 노래, 뒤틀림 등 이미지의 충돌과 내면적 표상으로 읽어달라는 말이었다. 그렇다고 그 내면적 표상들이 이미지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미지를 이야기하기에는 나는 훨씬 유물론적이고, 우리는 모두 그 물질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충돌이든 표상이든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 노태맹은 마르크스주의자다. 그는 데리다를 인용하면서 마르크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의 '어긋남'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사람들이 내 시를 마르크스주의와 관련 없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나는 내 시가 유물론적이고자 한다. 나는 리얼리즘 문학만이 마르크스주의적이라는 말에 단호히 반대한다." 유물론과 관련해 그는 시어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충동, 힘을 느낀다고 했다. 말은 단순한 지시 수단이 아니라 유물론적이고 통시적이며 공시적인 역사적 지평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 힘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고,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힘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태맹은 자신의 시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시도, 외우는 시도 없다고 했다. 다만 시적 소재로 아끼는 이미지로 제강(帝江)을 꼽았다. 산해경에 나오는 신비의 동물로 몸은 있되 머리는 없는, 소를 닮은 동물이다. 노태맹은 제강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이 동물이 모든 감각을 오직, 머리가 없으니, 몸뚱어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젠가 나의 사랑도 끝날 것입니다 (중략) 우리 슬픔으로 흘러 넘치는 만들어진 강물소리 같은 것이어서/ 언젠가 끝날 내 사랑도 우리의 生도/ 당신에겐 섭섭지 않겠지요/ 검은 느티나무 아래/ 유리의 둥근 구슬 삼킨 내 몸 붉은 이끼로 뒤덮이고/ 붉은 꽃으로 부서지고 부서진 뒤쯤에야/ 먼 강물소리 당신 사랑도 끝날 것인지요/ 아직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고/ 당신은 내 사랑도 없이 먼 강물소리 건너/ 어찌 그리 잘도 가십니까'
그의 시 '붉은 꽃을 버리다'의 일부다. 무엇을, 누구를, 혹은 또 다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물었더니 '한용운처럼 읽어달라'는 답만 돌아왔다. 한용운처럼 읽어달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시인의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것일까. '마음 가는 대로 썼으니 마음 가는 대로 느껴라'고 답한 것일까.
노태맹의 첫 번째 시집 '유리에 가서 불탄다'와 두 번째 시집 '푸른 염소를 부르다' 사이에 13년이라는 공백이 있다. 긴 공백에 대해 그는"시인에게 시는 작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를 바라보는 그 태도, 혹은 시선이 중요하다. 시를 쓰지 않았지만 시는 항상 나를 만지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항상 내 마음을 열어두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물리적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몇 번 만났던 노태맹은 말이 없었다.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물음에 답할 때도 짧았다. 그 탓에 차가워 보이고 불만도 많아 보인다. 그는 '세상에 불만 많으냐'는 말에 '그렇다'고 했다. 철학자 레비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는"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얼굴 앞에 나타나는 타인의 찡그린 얼굴들이 싫다. 찡그린 얼굴, 마음에 들지 않은 얼굴을 내 앞에서 폭력적으로 치워버리든지, 찡그리지 않을 수 있는 환경(세상)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 누가 내 이 찡그린 얼굴을 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좀처럼 모임에 나오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에 대해 '낯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태맹은 철학과와 의대를 다닌 사람이다. 그는 시가 따뜻한 감성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 사물과 사태에 시비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 시라고 했다. 그리고 철학은 자신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들(밝은 눈, 깊은 생각)을 제공해주었다고 했다.
시인 노태맹은 노인병원 의사다. 다반사로 죽음을 본다. 그는 삶과 죽음 사이의 좁은 틈, 구분하기 힘든 그 틈을 발견할 때, 그 틈을 느낄 때 시를 만난다고 했다.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모른다. 머리로는 알겠지만. 죽음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내가 죽음을 알까? 하지만 가끔씩 죽음을 손끝으로 까칠까칠하게 조금 느낄 때가 있다. 시가 내게로 오는 순간이다."
'유리에 가서 불탄다, 제석봉을 내려오다, 모두들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붉은 꽃을 버리다, 나는 소리내어 읽는다, 흰 무꽃을 보다, 젖은 편지를 찢다….'
노태맹의 시 제목들이다. 그의 작품에는 유난히 '다'로 끝나는 제목이 많다. 노태맹은 의도적이라고 했다. 제목이 시의 부수적인 것으로 혹은 시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했다. 작품 하나하나가 제목을 중심으로 펼쳐져 나가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다'로 끝맺음하는 것과 관련해 시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적 구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완결적 구도'에 대한 강조는 노태맹이 자신의 시에 대해 설명을 거부하는 이유이자, 과작인 이유처럼 들렸다.
▷ 노태맹은=1962년 경남 창녕 출생. 계명대 철학과, 영남대 의학과 졸업. 1990년 '문예중앙'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유리에 가서 불탄다'(세계사), '푸른 염소를 부르다'(만인사)가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