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의 등산객들이 출발에 앞서 반반으로 나눠 구호를 외친다. 한쪽이 "99" 하자 다른 쪽이 "88" 하고 화답하는 것이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자는 얘기라고 했다.
米壽(미수) 白壽(백수)를 넘어 茶壽(차수)라는 말까지 도는 것도 같은 염원 때문일 터다. 알다시피 十(십)자 위'아래에 八(팔)자가 있어 88세로 破字(파자)돼 읽힌다는 게 米壽다.
白壽는 100을 가리키는 百(백)에서 맨 위 한 획을 뺀 白자를 써 99세를 가리킨다고 했다. 茶壽는, 위의 艸(초)가 의미하는 20과 米(미)의 88을 합산해 108세를 이르는 말로 쓴다는 얘기다.
하지만 옛 어른들은 오래 사는 것 못잖게 '죽는 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곤 했다. 편안한 임종이 그만큼 쉽지 않아서일 터다. 게다가 이제는 자연스런 임종조차 힘들게 돼 간다. 자연생명이 끝난 뒤에도 기계에 의존해 생존을 계속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서는 고통스럽고 가망 없는 치료 대신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아들이자는 '슬로 메디신(slow medicine) 운동'이 벌어진다고 한다. 88세 된 한 심장병 노인은 수술 대신 그 길을 택해 매우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고 했다.
초기 치매를 앓던 86세의 한 노인도 인후암 진단이 내려지자, 조직검사 마취 수술 방사선치료 약물치료 등등 무겁고 힘든 치료과정 대신 스스로 이 세상과의 이별을 선택했다고 했다.
국내에선 작년 어린이날 별세한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다. "병원에는 일 년에 두 번 정도만 가고 약이라곤 혈압약만 먹어. 살겠다고 날마다 병원 가고 하는 거, 내 생명을 저울질하며 사는 것 같아 싫어." 그가 생전에 남겼다는 말이다.
지난달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도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거부, 끝까지 자기 호흡을 유지하다 영면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법원 또한 근래 김모(77) 할머니 사건과 관련해 2심에 걸쳐 존엄사 수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고 보니, 미수니 백수니 하는 파자 놀음은 우리와 안 맞는 것이니 버리자는 주장이 기억난다. 우리 속에 문화적 뿌리를 가진 게 아니라, 壽福(수복)에 대한 일본인들의 집착을 반영한 그 나라식 조어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다.
박종봉 논설위원 pax@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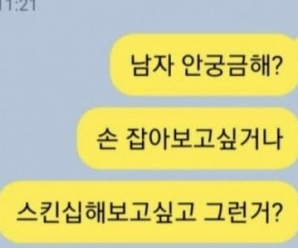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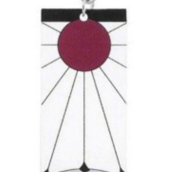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교착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요타보다 비싸지는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