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대구 수성구청 인근은 완전히 변두리였다. 달구벌 대로를 따라 만촌 네거리 쪽으로는 키 낮은 집만 듬성듬성했고, 논밭과 빈터가 대부분이었다. 너무 많이 변해 어렴풋하지만 지금의 범어4동 뉴 대공원 아파트 근처에 집이 있었다. 버스가 다니는 큰 길에서 남쪽으로 300~400m는 들어간 곳이다. 왼쪽으로는 꼴이 같은 집들이 줄지어 있고, 맞은편은 좁은 도랑이었다.
집은 가장 안쪽이었다. 더 들어가면 논밭과 야산뿐이었다. 논밭이 꽤 넓어 산까지 가려면 좁은 논두렁길을 따라 20~30분을 걸어야 했는데 마치 호수 안의 섬처럼 생긴 야트막한 언덕을 지나야 했다. 이곳에는 100여 그루가 넘는 버드나무가 빽빽했다. 버드나무 줄기가 흔들거리는 모습은 늘 무서웠다. 버드나무 귀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멀리 희뿌옇게 비치는 모습에 늘 뒷덜미가 서늘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오후 네댓 시쯤부터 이 숲엔 제비가 날아들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제비는 수천 마리로 늘어나 하늘이 까맸다.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온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이유는 아무래도 좋았다. 저녁노을로 온통 발간 서쪽 하늘에 수천 개의 검은 점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모습은 대학 초년생의 가슴을 늘 두근거리게 했다. 한 시간 이상이나 멍하니 하늘만 보는 날들도 많았다.
그 집에서 살던 1년여 동안 워낙 눈을 즐겁게 한 터라 세월이 흘러도 언젠가는 다시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젠 영 어려워진 것 같다. 제비의 숫자가 너무 줄어 그만큼의 제비떼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2000년 100㏊당 제비 밀도가 37.0마리에서 지난해에는 21.2마리로 줄었다고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빠른 도시화 때문이다. 농촌에도 제비가 둥지를 틀 수 있는 기와집과 초가가 거의 없다. 농약과 살충제는 제비의 먹이인 날아다니는 벌레를 살지 못하게 한다.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 제비나, 금붙이로 된 왕자의 동상을 한 조각씩 떼어내 가난한 이에게 날라주던 제비가 까치로 바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지화 논설위원 akfmcpf@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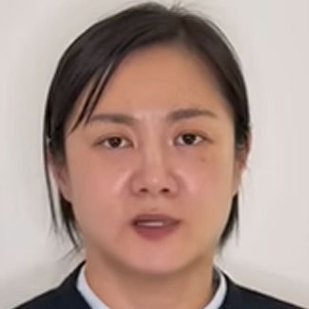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