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대구에서 영주를 거쳐 봉화로 접어들 때만 해도 고속도로 버금가는 국도로 승부역에 가는 길은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를 지나자 신록이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지고, 비포장 임도를 방불케 하는 노면에 수직으로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오른쪽으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더욱이 노폭은 기형적으로 좁아져 행여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자동차라도 만난다면 생명을 담보로 한 후진까지 각오해야 할 판이다. 오지(奧地), 그 낯섦에서 기인하는 두려움과 불편함이 여행자의 어깨를 마구 짓누른다. 이쯤 되면 이제 여행은 가혹한 고문이다.
합리와 효율이란 짐을 배낭에서 꺼내어 버리기로 한다. 끊임없이 샘솟는 호기심과 목표를 향한 집념이 저 무모한 길로 다시 나를 이끈다. 모험과 스릴이 없는 승부는 승부가 아니다. 비록 부질없는 희망이라 할지라도 희망은 좋은 것. 그렇게 구절양장 같은 그 좁은 길을 30분 남짓 달리다 보면 드디어 저 산비탈 위로 몇 채의 인가가 나타난다. '범죄 없는 마을(이런 곳에서 범죄란 어떤 의미일까?) 승부리(承富里)' 산을 깎아 만든 밭에는 천궁, 당귀 등 온통 약초뿐이다. 그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을 지나자 다시 계곡으로 향하는 급경사가 이어지고 조심스레 그 길을 내려서니 드디어 청옥 같은 낙동강 너머로 승부역이 보인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작은 섬 같다. 순간, 내가 이긴 것인지, 봄이 이긴 것인지 분간할 수없는 감동이 밀려든다. 급히 차에서 내려 승부역으로 향하는 현수교를 건넌다.
하늘도 세평, 땅도 세 평, 꽃밭도 세 평.
투구봉과 비룡산에 둘러싸여 마치 천혜의 요새 같은 이곳에 역사(驛舍)가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선로 위로 올라가 허겁지겁 봄의 흔적들을 주워 담는다. 잠시 후, 제복을 걸친 중년의 사내가 승강장 쪽으로 걸어 나온다. 인간이라곤 나와 그 둘뿐, 그 외에는 모두 가공되지 않는 순수 자연뿐이다.
"사실 외롭죠. 때론 적적하기도 하고. 하루에 두 세 쌍 정도 여행객이 자동차로 이곳을 찾아요. 그때가 사람들과 대면하는 유일한 시간이죠."
얼음사나이 최영일(52)씨. 현재 이곳 지킴이인 그의 공식직함은 영주지방철도청 소속 열차운용원. 그의 얼굴은 돌과 나무, 물과 꽃을 닮았다. 대합실 옆에 설치된 '빨간 우체통'은 이곳을 찾는 여행객에겐 단연코 최고 인기. 한 장에 500원하는 우편엽서는 전국 어디로도 배달되는 감성 전도사다.
각금굴 속으로 어둠이 찾아들 때쯤, 대구로 다시 발길을 돌린다. 솔직히 고백컨대 두 번 올만한 곳은 아니다. 초보운전자라면 절대 사절. 하지만 비루한 삶의 늪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무언가에 승부를 걸어보고자 한다면 완전 강추다. 만약 승부역까지 오는 길이 아름답게만 느껴진다면 세상과의 승부도 그다지 험난치 않을 것이다.
글·사진 우광훈 시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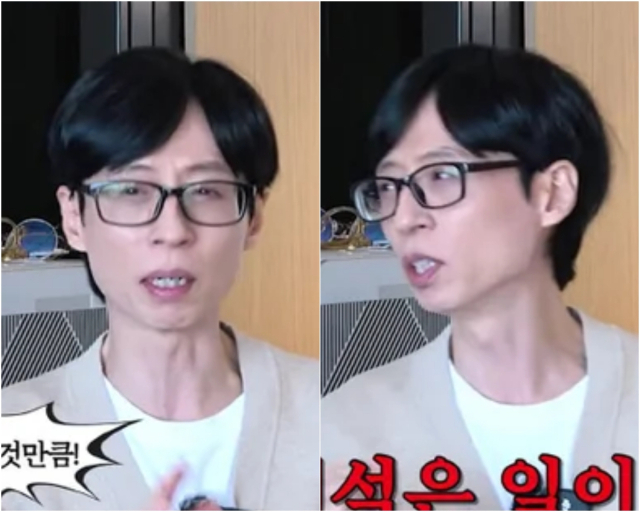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