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어디를 가나 사찰은 쉽사리 눈에 띈다. 유명한 사찰은 누구나 상식 이상의 지식 내공쯤은 갖고 있을 게다. 그렇지만 대개 사찰의 겉모습에만 매료되고, 주마간산격으로 안내판 정도 읽고 지나친다. 문화 전성시대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좀 더 깊게, 그리고 의미 있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소보면 청화산의 남쪽 허리에는 법주사(法住寺)가 있다. 고찰(古刹)이다. 그런데 겉은 아닌 것 같다. 절은 한창 중건 중이었다. '현대'라는 건축기법이 적용되고, 불상도 직접 만들고 있었다. 고찰의 상징인 단청은 너무도 깔끔하게 새 옷을 입어 버렸다. 아쉬웠다. 그래서 혹자는 "고찰 맞아?"라고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주사는 예사롭지 않았다. 법주사는 전통과 역사가 서린 신라의 고찰이다.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내공이 무협소설의 최고수 수준이라는 의미다. 법주사는 창건연대부터가 고찰 중 고찰이다. 대구에 있는 동화사의 창건 연대인 신라 애장왕 2년(8세기)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신라 소지왕(480년) 때 삼지국사가 지었다는 견해도 있다. 5세기 사찰이라면 국내 사찰 중 오래되기로 손에 꼽힌다. 신라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이차돈이 순교한 6세기이다. 이차돈의 순교로 법흥왕이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불교가 공인받기 훨씬 전에 법주사가 창건됐다는 논리이다.
법주사와 지척인 구미 선산 땅에는 도리사라는 절이 있다. 신라에 처음 불교가 전해진 때는 고려에서 온 아도화상이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지 않자 지금의 선산 땅에 머물며 몰래 집을 짓고 포교를 한 시기다. 바로 지금의 도리사 자리이다. 도리사는 5세기인 신라 소지왕 때 창건됐다고 한다. 그래서 신라 최초의 절은 이차돈의 순교지에 세운 홍륜사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도화상이 신라에 불교를 전한 선산 땅의 도리사라는 설도 있다.
여하튼 소보의 법주사는 도리사를 지척에 두고 있는 것으로 봐 분명 역사가 오랜 사찰이었을 것이고, 신라에 불교가 전해지는 시기에 신라의 몇 안 되는 핵심 사찰(군위는 종주 사찰이라고 한다) 역할을 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법주사의 옛 규모를 보면 법주사가 신라의 대표 사찰이었음이 더욱 확연해지는 것 같다. 우선 3만㎡(1만평)의 사찰 경내에 묻혀 있는 주춧돌은 눈으로도 절의 규모와 크기를 쉬 짐작케 한다.
또 경내 소전각에는 왕맷돌이 보관돼 있다. 일행이 지금껏 본 '가정용 맷돌'은 비교가 안 된다. 암돌과 숫돌 모두 지름이 115㎝, 두께가 15.5㎝로 '대왕급'이다. 장정 10명이 매달려야 들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크고 유일한 네 개 구멍 맷돌이다. 왕맷돌은 절 남쪽 200m 정도 떨어진 밭두렁에 반쯤 묻혀 있던 것을 50년 전 신도들이 지금의 절로 옮겼다. 왕맷돌은 식구가 많은 사찰에서 주로 사용됐거나 절 창건이나 중건 때 인부들의 음식을 만드는 기구로도 쓰인 것으로 추측돼 법주사의 규모를 가늠케 했다.
또 1977년 초 법당 천장의 비가 새는 곳을 고치기 위해 용마루를 헐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불교경서가 발견됐다. 특히 함께 발견된 절 관련 기록에 의하면 본당 서편에 파불(파손된 부처) 15좌가 매몰됐고, 다섯 불상은 대법당 앞에 묻어 두었다고 적어 화재나 재난을 당하기 전의 법주사가 얼마나 웅대한 지를 다시 추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법주사는 대형 괘불도(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던 대형 걸개그림)도 갖고 있다. 길이가 23자 5치(약 7m), 폭이 15자(4m56㎝)이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불교 문화재이다.
안타깝게도 소보 법주사의 옛 외형은 잦은 화재 등으로 상당부분 소실됐지만 그 역사와 전통만큼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법주사 탐방은 이제 겉보다는 속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우린 발걸음을 보각국사 일연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고로의 인각사로 옮겼다.
인각사는 8세기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됐다고 한다. 경내에 석등 등 9세기와 고려 초 유물이 다수 있어 절의 역사를 읽을 수 있었다.
인각사의 지급 모습은 왜소했다. 하지만 인각사의 내공 역시 신라를 대표한 소보 법주사와 함께 신라의 고찰이자 고려의 중심 사찰이다. 또한 지금 국내 고고학계를 놀라게 하는 문화재가 출토되고 있는 사찰이다.
고려 말 충렬왕은 왕명으로 인각사를 크게 중수했고, 100여경(약 100만㎡로 지금의 의흥들)의 땅을 하사해 보각국사의 하안소로 삼았다. 하안소는 왕이 임명한 국사와 왕사가 은퇴해 머무는 절을 말해 인각사의 당시 위상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보각국사는 인각사에 머물면서 불교계 9계 산문의 모임인 구산문도회(지금으로 치면 전국 최대 규모의 승려모임)를 두 번이나 열었다. 인각사가 고려 후기 불교계의 중심 사찰이었기에 가능한 구산문도회가 아니었을까.
고려 불교의 본산이었던 인각사는 새로운 유교 이념으로 무장한 조선이 들어서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태종과 세종 때 두 차례의 사원 정리 정책으로 그 지위가 말사(末寺)로 떨어졌고, 더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사찰의 전각 대부분이 불에 탔고, 법당 마당에 있던 보각국사비도 크게 파손돼 버렸다. 특히 보각국사비의 글씨는 중국에서도 드문 서성(書聖) 왕희지의 집자(集字)로 국내 금석학과 서예사에서 보물로 여겨지는 문화재이다. 폐사 지경에 처한 인각사는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조선의 역사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인각사는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인각사는 1991년부터 발굴을 시작해 현재 5차 발굴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발굴을 통해 고려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인각사 규모와 전각 배치 등이 확인됐고, 수많은 기와와 자기조각들이 출토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5차 발굴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이 다량 출토됐는데 금동병향로, 청동향합, 청동정병 등 불교 의식구가 일괄 출토된 예는 국내에서 유일했다. 이들 출토 유물의 정교한 주조기술과 세련된 형태감은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보여줘 당시 전문가들은 보물급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평가한 바 있다.
인각사의 발굴이 마무리되고, 발굴 과정에서 사료들이 출현한다면 보각국사의 성지인 인각사의 역사가 불교계에 우뚝 서지 않겠는가.
이종규기자 군위·이희대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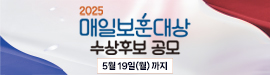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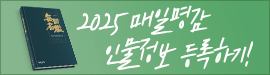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