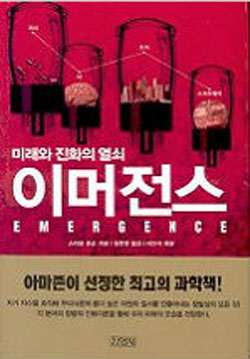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 정치적 동물'이라 칭하여 '만물의 영장'이란 지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소위 창조적 업적이란 것들을 보면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언어와 문자 체계를 만들어 의사소통을 쉽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경험을 공유하고 그것을 축적,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신에게서 훔쳤다는 불을 활용하여 겨울을 이겨내었고, 겨울잠을 자지 않고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곁에는 '문명'이라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 쌩쌩 달리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비행기, 밤을 밝히는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각종 전선 가닥들로 꽉 찼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고, 옆구리에는 노트북이 끼워져 있고, 입으로는 커피나 콜라를 마시고, 귀에는 MP3가 매달려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듣고, 말하고, 움직입니다. 이것이 진화의 정점에 위치한 동물,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진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탈, 많이 먹어서 탈, 서로 먹으려고 탈, 온통 탈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진화한 동물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등 동물이라 규정한 강장동물 아메바나 히드라를 봅시다. 그들이 배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먹은 곳으로 배설하면 그 뿐입니다. 촉수를 춤추듯 흔들면 먹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필요 없습니다. 조개 껍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말미잘은 이동을, 조개는 안전을 확보하는 공생적 사회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진화된(?) 인간의 모습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먹고 사는 과정에서 순탄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생후 일정 시간만 지나면 먹는 입에서 배설하는 항문까지 탈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심과 시기심, 그리고 질투로 얼룩져 있습니다. 보다 편하게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 조금씩 자신을 죽이는 흉기로 변하고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귀찮은 모기를 죽이려고 에어로졸 스프레이를 개발해 뿌려대지만 스프레이가 인류 전체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차라리 인간과 같이 진보된 전뇌가 없는 개미는 거대한 양의 토양을 이동시키고 척박한 땅에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환경을 살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스티븐 존스의 『이머전스emergence』(김영사, 2004)를 보면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種)'이라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숫자 면에서 지구를 지배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개미입니다. 공간 면에서도 인간보다 개미가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개미가 살지 않는 지역은 남극,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그리고 폴리네시아뿐이라고 합니다. 사회관계 면에서도 사회적 동물인 인간보다 사회적 곤충인 개미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 사는 버섯흰개미는 높이가 4m나 되는 탑 모양의 둥지를 만드는데, 이는 개별 개미의 능력을 고려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곤충학자 윌리엄 휠러는 이를 두고 초유기체(super organism)라고 했습니다. 개개의 흰개미가 가진 능력의 총합을 훨씬 뛰어 넘는 지능과 적응 능력을 보여준 흰개미의 집합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들판에 사는 개미 집단은 식량이 있는 곳에 이르는 최단 거리의 길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거리와 접근 용이성을 따져 어느 곳에 먼저 갈 것인지도 결정한다고 합니다. 외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일개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둥지를 만드는 일이나 애벌레를 기르는 일을 하기도 한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임무를 바꾸면서 사회적 협동을 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들 개미들에게는 전체 개미집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개미가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변명하는 인간 무리에게 또 다른 부끄러움을 주는 대목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