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11학년도 대입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토플, 토익 점수와 경시대회 수상 경력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어학 특기자를 뽑는 일부 전형은 예외다. 또 해외 봉사 활동 실적이나 사설 기관의 고액 캠프 참여 실적도 배제한다. 입학사정관제에 따른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 입시의 핵(核)이 되고 있다. 지난해 4천555명 모집에서 올해는 2만2천787명으로 다섯 배나 늘었다. 현 정부의 확대 방침에 따라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학사정관제는 정부의 강경 주도로 각 대학이 준비 없이 확대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과 부담을 주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맞춘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정시 모집 인원이 줄어들어 대학의 문은 더욱 좁아졌다. 과거처럼 열심히 공부를 한 수험생은 불리한 셈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대학의 협조와 공교육 활성화가 필연적이다. 현재처럼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열심히 살리면 된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기준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 각종 대외 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면 자신만의 독특한 스펙을 쌓기도 쉽지 않다. 획일적인 기준 마련은 쉽지 않겠지만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최소한의 모범 기준은 제시해야 수험생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반드시 공교육 활성화와 연계돼야 한다. 독특한 스펙을 쌓은 학생 뽑기로 변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생활만 충실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을 막지도 못하고, 수험생에게 혼란만 주는 제도가 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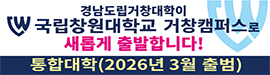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