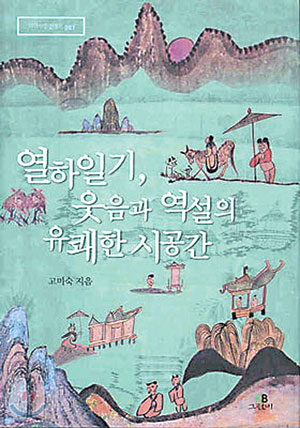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은 고전연구가 고미숙을 사람들에게 알린 책이다. 이 책은 조선 중기 문인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오늘날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쓴 것으로, 일종의 고전해제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연암의 글만큼이나 고미숙의 글도 문체가 발랄하고 글이 맛깔스럽다.
연암의 열하일기는 형식상으로는 압록강을 건너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마테오 리치의 무덤에서 끝나지만, 그것은 사실 시작도 끝도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언제나 중도에 있으며, 따라서 어디서 읽어도 무관하게 각각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열하일기의 수많은 고원들은 바로 시각조차 촉감처럼 만지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감응하는 유목적 여정의 산물이다.
연암은 중국행 사절단의 비공식 수행원이었다. 공식 참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사절단의 유일한 여행자로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연암의 목적은 눈요기를 위한 관광이 아니었기에,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고, 보이는 것에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보려 했다. 길에서 만난 여인네들의 장신구, 패션, 머리 모양에서부터 곰이나 범, 온갖 동물들의 모양새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선과 필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번은 객관 밖에서 재주부리는 앵무새의 털빛을 자세히 보려고 등불을 달아 오는 동안에 주인이 가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낮에 의기투합한 이들을 만나기 위해 밤에 대열을 몰래 빠져나와 밤새 술을 마시며 필담을 나누는 것이 보통이었다. 새벽녘이 되어 의자에 걸터앉은 채 꾸벅꾸벅 졸다가 훤하게 동이 트면 놀라 깨어 여관으로 돌아오곤 했다. 일행은 압록강에서 연경까지 약 2천 3백여 리, 연경에서 열하까지 약 700리, 합쳐서 육로 3천 리라는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찌는 듯한 무더위, 몸서리처질 만큼 엄청난 폭우, 산처럼 몰아치는 파도 등을 겪는다. 땅의 기운도 거칠기 짝이 없어 요동 진펄 천 리는 죽음의 늪과도 같다. 연암은 그 과정들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생생하게 포착한다.
당시 중국은 만주족인 청나라 세상이었다. 연암은 중화주의, 북벌, 주자학 같은 당대의 첨예한 쟁점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석한다. 편협한 소중화 사상에 빠진 조선과 호탕하고 유연한 오랑캐나라 청 사이에서 청과 조선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를 짚어내기도 한다.
열하일기에는 코끼리에 대한 묘사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곳에 몰려든 인간 군상들 역시 동물들 못지않게 기이하고 다채로웠다. 중앙아시아 근동의 회회교를 믿는 회회국 사람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몽골왕, 아라사, 류규, 위구르 등 청나라를 둘러싼 주변 이민족의 왕족들에 대한 연암의 시선은 진지하기도 하고 장난스럽고, 깔보는 듯하면서도 예리하다. 게다가 고북구를 지날 때는 진짜 괴상한 종족을 만나기도 한다. 그 종족은 대부분의 여인네가 목에 혹을 달고 있었다고 한다. 큰 것은 거의 뒤웅박 정도, 더러는 서넛이 주렁주렁 달린 이도 많았다. 열하에서 보낸 시간은 모두 엿새였는데 무척 매혹적인 공간으로 묘사된다.
정조 시절 문체반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문체는 체제가 지식인을 길들이는 가장 첨단의 기제이기 때문에 지배적인 사유를 전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문턱이라고 한다. 개혁군주로 알려진 정조지만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한 새로운 형식의 글들을 잡문이라면서 과거에도 응시하지 못하게 했다. 문체를 둘러싼 지배층과 지식인들의 팽팽한 긴장과 갈등. 이덕무와 이옥이 주로 비판받았고, 연암은 이 문체반정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다. 연암이 시대와 불화하게 된 연유이다. 허생전, 양반전, 호질, 광문자전과 같은 연암의 소설들은 지금 읽어도 그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에 속이 후련할 정도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