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철교를 건너는 동안
잔물결이 새삼스레 눈에 들어왔다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빼서 서울을 떠난 후
낯선 눈으로 바라보는 한강,
어제의 내가 그 강물에 뒤척이고 있었다
한 뼘쯤 솟았다 내려앉는 물결들,
서울에 사는 동안 내게 지분이 있었다면
저 물결 한쪽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결 하나 일으켜
열 번이 넘게 이삿짐을 쌌고
물결 하나 일으켜
물새 같은 아이 둘을 업어 길렀다
사랑도 물결 하나처럼
사소하게 일었다 스러지곤 했다
더는 걸을 수 없는 무릎을 일으켜 세운 것도
저 낮은 물결 위에서였다
숱한 목숨들이 일렁이며 흘러가는 이 도시에서
뒤척이며, 뒤척이며, 그러나
한 번도 같은 자리로 내려앉지 않는
물결 위에 쌓았다 허문 날들이 있었다
거대한 점묘화 같은 서울,
물결 하나가 반짝이며 내게 말을 건넨다
저 물결을 일으켜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어쩌다 볼일 보러 서울 갈 적에 한강을 건너노라면 문득 옛 서울 시절을 떠올려보게 된다. 가난했던 시절, 몸 누일 방 한 칸이란 저 거대한 점묘화 같은 각박한 서울에선 그야말로 뼈저리게 아쉬운 화두 같은 것이었다. 시인도 얼마 안 되는 보증금을 빼서 서울을 떠난 걸 보면 처지가 거기서 거기였던 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서울 사는 동안 나름대로 지분을 가졌었다는 특유의 착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지분이란 게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기껏 강물에 일렁이는 물결 한 쪽이라니! 그러나 시인은 오로지 그 물결 하나의 일으킴/일어섬으로 열 번 넘게 이삿짐을 쌌고, 물새 같은 아이 둘을 업어 길렀으며, 사랑마저 물결 하나처럼 사소하게 일었다 스러지곤 했다는 걸 인식한다. 더는 걸을 수 없는 무릎을 일으켜 세운 것도 저 낮은 물결 위에서였다는 언술은 눈물겹다. 물결은 김수영 시인의 '풀잎'처럼 일어났다간 곧 스러지곤 하지만 거듭거듭 또다시 일어서는 저력을 지녔다. 물결에게 포기란 없다. 삶이라는 물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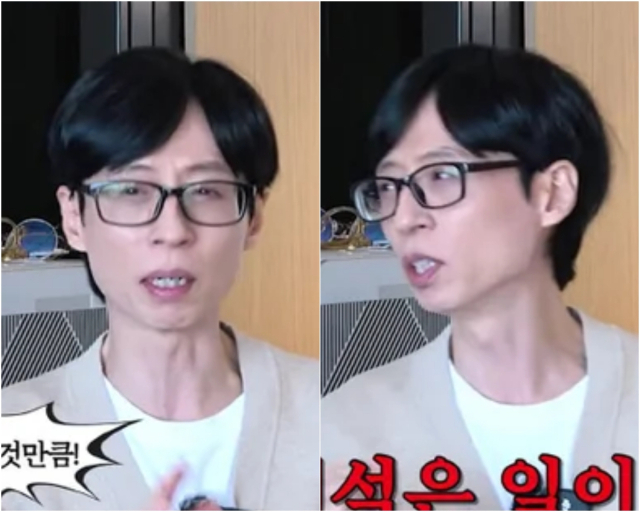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