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대전이 독일의 패배로 끝나자 독일 군부는 빌헬름 2세를 퇴위시키고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사회민주당 정부에 권력을 이양했다. 패배의 책임을 민간 정부에 떠넘기려는 술수였다. 그리하여 사민당 정부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고 굴욕적인 베르사유조약을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고 패전이 좌파와 유태인의 배신 때문이란 생각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좌익이 독일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신화다.
이러한 관념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지만 좌익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전후 독일은 좌파 극단주의자들의 정부 전복 기도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1917년 11월 7일에서 1919년 5월 2일까지 존속했던 '뮌헨소비에트공화국', 1919년 1월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끈 '스파르타쿠스단 반란'이다. 이로 인해 '공산화'는 독일 국민에게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전후 독일 문화계를 지배한 자유주의 예술가의 '반독일적' 작품도 좌익에 대한 독일인의 반감을 부채질했다. 이들은 희곡, 소설, 회화 등에서 동성애, 근친상간, 포르노그라피, 부친 살해, 사도-마조히즘을 다루면서 독일인의 전통적 가치관과 생활양식, 애국심을 수구적인 것으로 매도했다. 바이마르 시대의 대표적인 유태인 풍자 작가 쿠르트 투홀스키는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다. "애국심은 가장 멍청한 관념이므로 가장 명예로운 것은 반역이다." "내가 외국에 건네주고 싶지 않은 독일군의 기밀은 하나도 없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 독일 문화는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는 진보적인 것일지 몰라도 패배의 굴욕을 삼키며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 회복을 갈구하던 당시 독일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런 사회'문화적 토양이 있었기에 '등에 칼을 맞았다'는 신화가 퍼져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천안함 46인을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갈망하는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반국민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런 목소리가 반향을 얻고, 그래서 이 땅에서 '등을 찔렸다'는 신화가 재생산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자칭 진보 진영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정경훈 논설위원 jghun316@ms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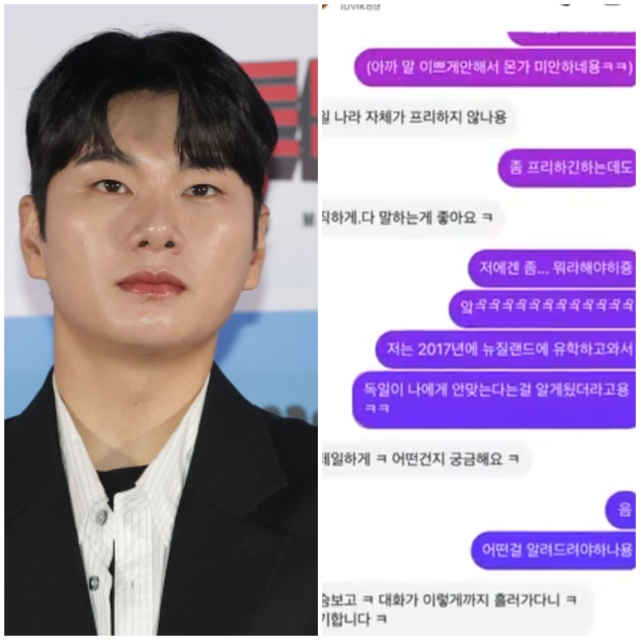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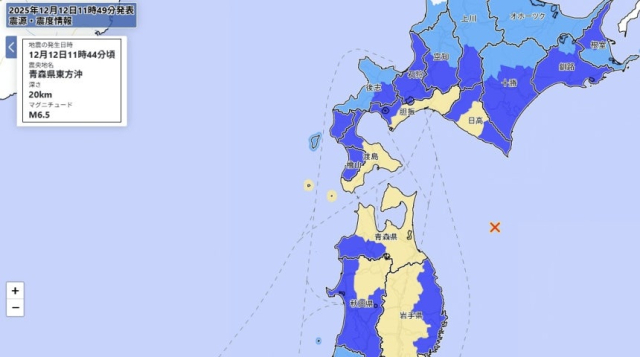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