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처음 서울 가서 하숙했던 동네는 종로경찰서 앞 안국동이다. 인근 계동, 가회동, 삼청동 등과 함께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돼 있어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골기와집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골목길을 산책하노라면 서울 아니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조선시대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이 동네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점차 세월이 가니 이런 행복감은 불행감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었다. 내 하숙집은 마당이 손바닥만 해 햇볕은 구경할 수도 없고 어떤 방은 흘러내린 벽의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벽지가 찢어져 방으로 흙들이 흘러내리기도 했다. 기둥은 땟국이 잔뜩 끼어 더럽기 짝이 없었다. 가장 괴로웠던 추억은 변소였다. 변소에 들어가면 바닥에 마루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에 두 개의 판자만 걸쳐 놓았으므로 초보자는 변소 바닥으로 추락할까 두려워 '볼일을 볼 때'마다 불안했다.
얼마 전 서울을 갔더니 애들이 북촌이 그렇게 좋다며 날 보고 가보자고 하였다. 북촌의 한옥들은 예와 달리 골기와도 깨끗했고 기둥들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던 삼청공원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맨 흙덩이였던 그곳이 이름 그대로 공원이 돼있는 모습을 보니 집도 자연도 아름답게 변해 있음을 느꼈다. 지금 저 집들이 몇 십년 전에는 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곳이었는지, 저 공원이 옛날에는 다만 흙덩이였음을 아는 지. 나는 말하지 않았다. 살림살이가 풍족해지면 흙덩이 산도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변화는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그저 좋아졌다는 생각만 하게 한다.
걷다보니 어느덧 북촌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해 있었다. 웬 사람이 다가오더니 "사진 찍으세요. 여기가 포토 존이에요"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 곳에 가족들을 서게 한 뒤 사진기를 들이대니 그 사람이 날보고 "선생님도 같이 서세요"라고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진기로 우리를 찍어주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관광객들에게 즉석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있었다. 나도 우리 가족이 담긴 예쁜 사진을 한 장 얻어 왔다. 내가 "돈이 많이 들텐데요?"하고 물으니 그가 대답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짜로 사진 찍어 드려도 난 굶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은 배가 불러요"라고 했다. 오랜만에 그 날 대구 오는 기차간에서 사람의 향기가 느껴져 참 행복한 기분이었다.
권영재 대구의료원 신경정신과 과장'서구정신보건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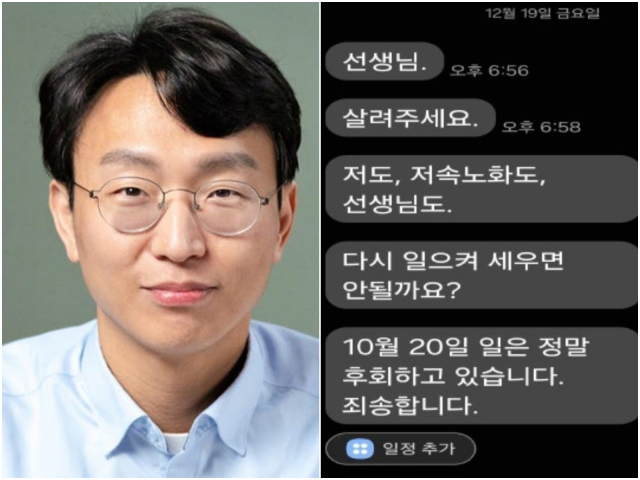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부전시장서 '깜짝' 고구마 구매…"춥지 않으시냐, 힘내시라"
"李,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거부권 행사하라"…각계서 비판 쇄도
李대통령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난 예수의 삶 기억"
홍준표 "통일교 특검하면 국힘 해산 사유만 추가"…조국 "동의한다"
'윤석열 멘토' 신평 "지방선거 출마 권유 받아…고민 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