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당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속도'다.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일단 빨리 걸어야 한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빨리 걷지 않으면 병원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선배들을 놓쳐 버리고 미아가 되기 일쑤다.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금방 허기가 진다. 그래서 밥이라도 먹게 되면 무조건 빨리 먹어야 한다. 천천히 먹다가는 수시로 찾아대는 응급 호출 때문에 굶기가 십상이다. 만일 그렇게 밥을 놓치고 응급 수술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언제 다시 먹게 될지 보장도 없다.
병원 안에서의 생활은 그렇다 하더라도 병원을 벗어난다고 사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회식 장소에서는 선배로부터 식사 중에 혹시 술잔이라도 받게 되면 최대한 빨리 마시고 돌려 권해야 한다. 술잔을 받아서 잠시라도 앞에 두고 있으면 '제사 지내느냐?'고 핀잔을 듣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잔이 상위에 착륙할 기회가 없어 공중에 떠다니게 된다.
정말 대단한 '속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빨리빨리'는 자연스럽게도 생활의 패턴으로 자리 잡혀 버렸다. 가족들과 같이 걸을 때도 혼자 한참을 앞서 걷다가 뒤돌아보곤 머쓱해서 우두커니 서서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2월에 밤 사이 갑자기 눈이 많이 내린 날이 있었다. 아침 일찍 회의가 있는 날이었는데 출근길 교통이 마비되어 하는 수 없이 병원까지 걸어가기로 하였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6㎞ 정도의 길을 걸어 병원에 당도하니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걷는 내내 혼자서 투덜거렸지만 며칠이 지나니 그럭저럭 걸을 만하더라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다. 거기에다 미끄러질까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바빠서 정신없이 걸었던 그 길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퇴근하면서 문득 집까지 걸어보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그 길은 이제껏 차를 타고 지나칠 때의 길이 아니었다. 전혀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자동차 속도에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걸으면서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놀라울 지경이었다. 여기저기 담벼락에 흐드러지게 핀 줄장미, 할머니들이 좌판에 펼쳐놓은 갖가지 채소들, 아내가 아파서 잠시만 쉰다는 이발소 아저씨의 글쪽지는 걷기 전엔 못 보던 것들이었다.
그렇게 재미를 붙여서 이젠 아내까지 꼬드겨 주말이면 이곳저곳 다른 동네들을 하루 종일 같이 걸어다닌다. 흘낏 보거나 잠시 스치고 지나친 것들이 자세히 보이고, 또 오래 보니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아내와 같이 걷다가 어느 동네 어귀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들려준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호영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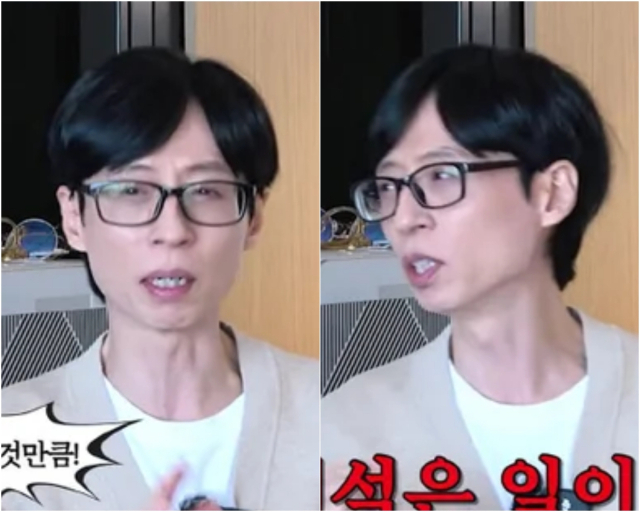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