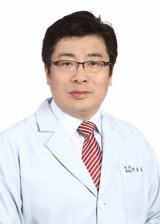
7월 7일 0시 남아공 더반에서 전해든 낭보에 많은 국민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 잠 못 들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평창'을 호명하던 순간,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울려 퍼졌던 '서울'을 외치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정확히 30년 전의 일이었다. 그 사이 한국은 놀랄 만큼 발전했고, 시민의식도 한층 성숙했다.
동계올림픽은 지구촌에서 사실상 선택된 나라들, 북반구의 일부 국가만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조건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동안은 좀처럼 그 대열에 낄 수 없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독점했고, 그나마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두 번 개최하는데 그쳤다. 이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당당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올림픽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도시를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절호의 기회이다. 통상 기업 인지도를 1% 올리는데 100억달러가 든다는데, 이번 기회를 잘만 활용하면 기업들은 엄청난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일본은 1964년 도쿄하계올림픽과 1972년 삿포로동계올림픽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회사, 미즈노와 아식스를 배출했다. 아직 이렇다 할 브랜드가 없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번이 찬스다.
연구소들은 벌써부터 20조니 60조니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식의 호들갑은 적잖이 걱정스럽다. 들뜬 모습을 진정시키고 지금은 쿨다운 해야 될 때다. 온갖 큰소리를 떵떵 치고 올림픽을 유치했지만 결국 적자에 허덕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올림픽 대회는 2주일 하면 끝나지만 지어놓은 건물은 30년 이상은 간다. 시설유지, 보수 관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경기장 하나 짓는데 1천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본 나가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유지관리 비용으로 3천만원이 나간다고 한다.
사실상 국민들은 유치효과 몇 십조원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고 납득도 잘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얻는 효과와 거둬들이는 수익과는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하는 게 좋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곧 출범할 텐데 조직위는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수치를 엄정하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동계올림픽을 응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초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의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명분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이렇다 할 부가가치와 경제적인 기반이 없는 도시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설악산 등 주요 관광시설들은 낙후돼서 현대화된 관광시설을 도입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관광벨트를 연계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가장 큰 관건은 아무래도 저변 확대가 아닐까 싶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비인기 종목들의 저변을 확대해 어떻게 적자를 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0만 국내 동호회가 있다는 축구에 비해 동계스포츠 동호회 수는 1만6천밖에 되지 않는다.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는 유럽 TV중계권료도 높고 상당히 인기 있는 종목이지만 우리로서는 관중을 모으기 쉽지 않다.
마지막 과제는 바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다. 남은 7년 동안 동계스포츠 유망주들을 발굴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동계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단시간 경기력 향상이 가능하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도자 양성과 심판 양성 등 체계적인 지원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도 오로지 금메달 중심, 승자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함께 어울리고 하나 되는 스포츠 정신이 뿌리내려졌으면 좋겠다.
최중근(구미 탑정형외과연합의원 원장)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