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이 돌아가신 날 모시는 기제사와 달리 명절에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부른다. 대개 설과 추석 두 번 차례를 지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식과 동지 등 다른 명절에도 차례를 지내기도 했다. 그런데 차례(茶禮)라 말하면서도 정작 차를 올리는 집안은 드물다. 하지만 역사에는 제사에 차를 사용한 기록이 종종 눈에 띄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지내는 시조신의 제사에 차를 사용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661년 문무왕은 수로왕의 17세손 갱세급간에게 시조의 제사를 지내도록 허락하였다. 신라에 합병된 이후 끊겼던 가야의 제사를 문무왕이 부활시켜 준 것이다. 통일과 함께 가야 출신들을 회유할 목적이었다. 이 제사에서 술과 단술을 빚고, 떡과 밥, 차와 과일을 제수로 올렸다. 높이 고인 상이 거창했을 것이다.
둘째는 불가의 제사이다. 부처님께 바치는 육법 공양 속에 차가 들어 있고, 신라 말 진감선사, 무염국사, 보조선사 등 명승의 상례에는 왕이 차와 약을 내리기도 했다. 고려 말의 나옹선사는 스승 지공으로부터 차로 법을 얻었다. 그는 스승의 영전에 차와 향을 갖추어 예를 다했다. 제문에 '엄연히 돌아가시매 형상은 예와 같았으나 온몸의 온기는 세상과 달랐었다. 이 불효자는 가진 물건이 없거니 여기 차 한 잔과 향 한 조각을 올립니다'라고 적었다. 모든 제수를 대신해 차와 향만을 사용한 것이다.
셋째, 조선시대 사대부도 제사에서 차를 올리고 싶어 했다.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의례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모델로 삼았다. 주자의 고향은 푸젠성(福建省) 우이산(武夷山) 일대로 유명한 차산지이다. 그 지역의 산물로 제상을 차리는 것이 당연한 일, 주자가례의 제사법에 국을 물리면서 차를 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주자의 고향과는 다르게, 조선에서는 차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다. 특히 16세기부터 불어 닥친 소빙기 한파는 웬만한 지역의 차를 얼어 죽게 만들었다. 주자를 신봉하던 조선의 사대부들은 차를 구하기 힘들어 제사를 지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이를 우려한 퇴계와 율곡은 제사에 차 대신 물을 써도 좋고, 또는 차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진행 순서를 담은 홀기에는 여전히 진다례(進茶禮)라 적혀 있고, 또 그렇게 순서를 알린다. 성현의 가르침에는 차가 없으니 대신 물을 쓰라는 것이고, 가능하면 차를 쓰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곧 제사에서 밥을 물리고 나서 차를 대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혹 갖춘 제사를 힘겹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은 차만 간단히 올리는 두 번째 형식을 선호할 듯하다. 근래 우리나라에도 차를 즐기는 인구와 차산업이 크게 발달했다. 차가 있는 차례를 되살려 전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차(茶)의 의례(儀禮)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박정희<원광대 외래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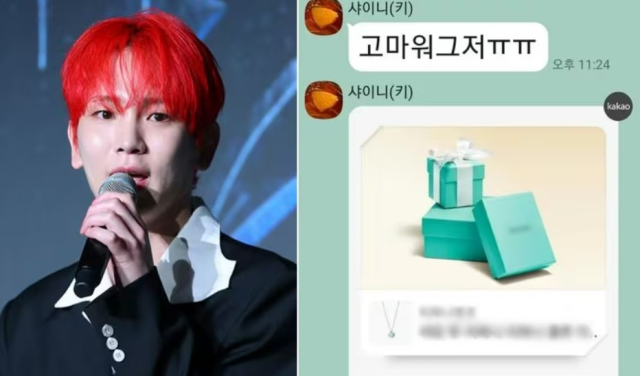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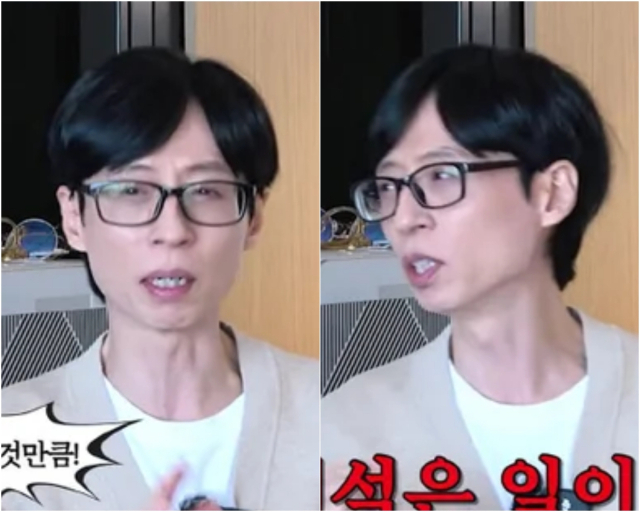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