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대회, 단합대회, 일반적인 회식 등의 문화는 놀이를 통한 공감 확장이다. 그만큼 놀이와 공감의 연관성이 크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인 폴 맥린은 "놀이가 흉허물이 없는 무대를 마련해주어 넓은 세상에 적응하게 해주는 책임감과 소속감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감이 공감 의식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말했다. 공감 확장과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놀이의 근본적인 특징과 공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놀이는 본질적으로 철저히 참여적이다. 놀이는 다른 사람과 무언가에 몰두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놀이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역할과 다른 상황에 대입하여 상상력을 펼친다.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려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자아이와 사내아이가 소꿉장난이나 병원 놀이를 하고 개나 말, 엄마나 아빠, 형제, 학교 선생님, 대통령이 되어 상상력을 펼칠 때 공감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다. 놀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둘째, 놀이 공간은 공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실이다. 놀이는 별개의 공간 '현실세계'에서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이 공간'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긴다. 그래서 워크숍이나 단합대회를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학교를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한다. 이렇게 별개의 놀이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놀이를 하는 사람은 더 편안하게 경계심을 풀고 잠깐이나마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함께 있다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인간은 순수한 놀이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참여하는 법을 배운다. 놀이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가장 심오한 행위이고 서로에게 몰입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교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려는 문화가 많다. 네덜란드의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는 모든 문화가 놀이에서 생겨난다고 간파하고 인간을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정의했으며 인간은 놀이를 통해 삶과 세상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놀이문화 없이는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기가 어렵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의 성인들은 순수한 놀이문화를 자주 접하지 못하고 있다.
순수한 놀이는 인간의 유대감이 가장 잘 형성되게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기업과 단체에서는 MT나 워크숍, 체육대회 등 각종 모임을 열어 아이들처럼 놀이의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때 CEO와 단체장들, 임원들이 평소의 권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직원들에게 다가설 때 완전한 하나의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놀이들은 딱딱한 회의석상에서보다 효과적으로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공감으로 하나 되는 순간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다.
박순임<글로벌공감교육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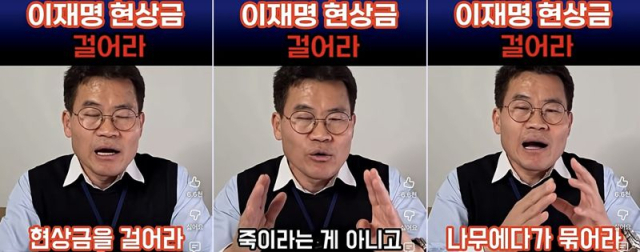


 ">
">





















댓글 많은 뉴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된 5·18묘지…장동혁 상의까지 붙들렸다
광주 간 장동혁, 5·18 묘역 참배 불발…시민단체 반발에 겨우 묵념만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이재명 정부 4대강 보 개방·철거 본격화…여야 전운 고조
"北 고 김영남, 경북고 출신 맞나요"…학교 확인 전화에 '곤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