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 1-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언젠가부터 간단한 찬거리를 살 때는 마트에 가지 않는다. 그냥 동네 어귀, 한갓진 길가에 보일 듯 말 듯 핀 들꽃처럼, 조그맣게 쪼그리고 앉아 계신 할머니들. 지나는 차들이 내뿜는 탁한 매연을 맡으면서, 날도 추운데 종일 꼼짝 않고 앉아,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시는 그분들은 겨울에도 지지 않는 꽃이다. 내다 팔 과일이며 채소들을 마치 장인의 그것인 양 다듬다가도 방전된 체력 탓에 꾸벅꾸벅 졸고 있기 일쑤인, 그분들의 정성을 사기 위해, 아니 그 고운 꽃 마음에 물을 주고 싶어 나는 일부러 길바닥에서 장을 보고는 한다. 다 낡은 어머니들의 관록 있는 손끝이 야무지게 깎아 둔 도라지며 쪽파 같은 것들, 여쭤봐야만 겨우 이름을 알 수 있는 산나물 같은 것을 사는 일이 이제 내게는 시나브로 익숙한 습관이자 일상의 소소한 낙이 된 것이다.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에 날깃날깃한 천원짜리 몇 장을 쥐여 드리면, 어두웠던 얼굴에 박꽃같이 환한 웃음이 피어난다. 그 순간의 할머니는 꽃보다 아름답다. 연방 고맙다고 머리를 조아리실 때면, 문득 겸연쩍어진 나는 봉지를 받아 들곤 도망치듯 자리를 끈다. 할머니도 참, 그게 뭐라고, 그냥 드린 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자조 섞인 혼잣말을 뱉어대면서. 하지만, 그러는 내 얼굴에도 싱긋한 미소가 번지는 게 느껴진다. 내게는 별것 아니지만, 할머니께는 작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꽃 웃음이 내게도 작은 기쁨으로 돌아오는 신비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의 바닥이 전기장판처럼 따뜻한 온기로 데워지는 겨울이다.
이지후(대구시 수성구 범어1동)
♥수필 2-남루한 일상이 눈부시게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친구야 나다"나지막한 여인의 음성이다.
누군지 의아해서 재차 "누구십니까 "했더니 "월배에 사는 숙이다." 그제야 "그래 숙이구나 잘 있었나?"했더니 며칠 전에 뇌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친구인데 친구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구를 찾아가려고 했더니만 극구 사양하며 며칠 있다가 몸 좀 좋아지면 놀러 오겠다고 했다. 친구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며칠 집을 비운 사이 야생화가 피어 있었는데 꽃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 했다.
그래서 수술해주신 의사선생님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고 꽃향기를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젠 내게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건재할 때 존재감조차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미미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 낙엽 하나, 한줄기 부는 바람에서도 삶의 경이로움에 감탄할 때 있다. 장미의 가시 같은 까칠함이 없어지고 국화꽃 같은 그윽한 향기가 친구에게서 묻어났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돌아와 화초에 물을 주며 이 순간이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본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남루한 일상이 불현듯 가을 햇살처럼 눈부시고 감미롭게 느껴진다.
강경순(대구 북구 동천동)
♥시 1-뒤안길
누군가 진군나팔을 불었지
하필 그때,
내 단꿈이 미처 뜸을 들이기도 전에
날마다 담벼락 위를 걷는 삶,
눈만 뜨면 우아한 착지를 바라보건만
순풍은 어지간히도 비싸게 군다
날카로운 호각소리, 노란색 경고는
그대에게서 왔던가
하지만 이젠 안타까운 추락을 만나야 할 때,
조금은 이른
과거만 앉아 노래할 수 있는 곳,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이 길에 앉아서도
그대와 난
예전처럼 마주 보며 웃을 수 있을까
대낮에도 어두운 이곳,
반딧불이가 끄는 희미한 별빛으로만
우리의 편지를 읽을 수 있을까
위로받고 싶은 바람만이 쓸쓸히
내리막을 타는 이 길에서…
여환탁(영천시 교촌동)
♥시 2-父想
당신은 이미 가셨지만
삼백예순 날, 한시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몰래 혼자서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펑펑 소리 내서 울고 싶었지만
그것은 내 진심이 아니기에
숨죽여 울었습니다.
가신지 세 해(三年)가 지났는데도
제 눈에는 그때 그 모습으로
너무나 또렷이 떠오릅니다.
당신께서 힘들어 하실까 봐
마음속으로만 울며 보내려
오늘도 애쓰고 또 애씁니다.
윤보원(구미시 공단동)
◆지난주 선정되신 분은 장정인(김천시 남산동) 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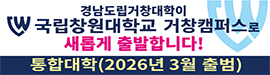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