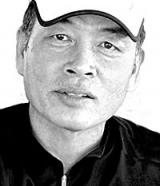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고향 마을로는 완행버스가 하루에 서너 차례씩 다녔다. 면소재지는 아니었으나 길이 갈라지는 삼거리여서 우리 마을에는 꼭 버스가 서서 승객을 내리고 태우고 했다.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은 늘 시간보다 일찍 나와 기다려야만 했다. 서비스는커녕, 승객을 짐처럼 여기고 걸핏하면 결행이나 연착을 밥 먹듯 하던 시절이었다.
세 갈래 길이 갈라지는 모서리쯤에서 우리 집은 떡 방앗간을 하고 있었다. 비바람을 피할 정류장이 따로 없었던 터라, 겨울이면 승객들은 염치불고하고 우리 집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 일쑤였다. 승객 중 일부는 방에 들어와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책꽂이의 책이나 공책을 함부로 꺼내 보면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물으면서 간섭까지 하곤 했다.
차 시간을 기다리는 승객들 때문에 우리 집은 사생활이 실종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게 싫어서 어머니한테 '방문 좀 걸어 잠그자'고 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기다릴라 캐봐라! 얼매나 춥겠노?" 하시면서 어떨 때는 '불청객'들에게 따끈한 가래떡에 시원한 물김치까지 내놨다. 매일 떡시루를 쪄냈기 때문에 방바닥은 항상 뜨끈뜨끈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집에 왔다가 읍내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인근 마을의 여고생이 우리 방에 들어와 버스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때는 시골에 여고생이 참 귀했다. 여중생도 찾아보기 힘들던 시절이었다. 하얀 칼라가 달린 다소 타이트한 상의에 잘록한 허리에서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까만 교복 치마를 입은 여고생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 여고생은 나를 어린아이로 취급했지만 그래도 나는 남자였다. 그녀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행복했다.
예쁜 여고생 누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죽음'과 '주검'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아나?" 그 당시는 영화제목 같은 데서 죽음과 주검을 많이 혼용하고 있었다. "잘 모르겠는데요." 여고생 누나는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다. "죽음이란 그냥 죽는 것을 말하고 주검은 죽은 시체를 뜻한단다." 그 여고생 누나는 그 무렵 국어 시간에 그걸 배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초딩이던 내게 그걸 써먹었을 것이고. 그 일 때문인지 그때부터 나는 국어에 관심이 많아졌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어 성적만은 항상 상위권이었다. 특히 궁금한 단어는 꼭 알아내고야 마는 버릇까지 생겼다. 지금껏 글쓰기와는 거리가 먼 직업을 가져왔음에도 이렇게 손에서 연필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여고생 누나 덕분인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글로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역설적이게도 그 행운을 예쁜 여고생 누나가 가져다주었다.
장삼철/삼건물류 대표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