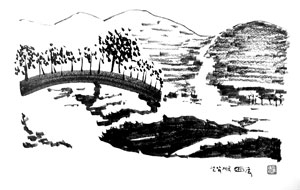
나는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중학교 2학년 때 짜장면을 처음 먹어봤다. 굳어서 떡이 되어 있는 것을 칼로 썰어 먹었다. 그 맛은 가히 환장할 정도였다. 대학 1학년 때 장어, 가오리, 병어가 한 쟁반에 담긴 싸구려 생선 모둠회를 처음 먹어봤다.
냉면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 아마 안동 36사단에서 병참 장교로 근무할 때 갈비 몇 대 구워 먹고 난 후 평양식 물냉면을 후루룩하고 마셔본 추억이 아련할 뿐이다. 동료 장교들과 함께 식재료 납품업자를 따라간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오래된 사진첩을 보는 듯하다. 음식에 관한 첫 경험을 늘어놓고 보니 약간 수치스럽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낯선 음식에 눈뜨게 되었고 이젠 여행과 음식에 관해서는 '반풍수'쯤 되었으니 내가 나를 봐도 대견스러울 정도다. "짜장면을 그때 처음 먹어 봤어"라며 놀리던 친구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딜 찾아가서 무얼 먹을까"하고 묻는다. "불어터진 짜장면을 먹어 봐"라고 할 수도 없어 묵은 노트를 찾아 전화번호까지 알려준다.
냉면은 어려운 종목이다. 와인만큼 어렵다. 와인 마니아인 친구 덕에 '들은 풍월'도 있고 여러 종류의 와인을 음악을 낮게 깔고 수없이 마셔 봤다. 그러나 혀가 와인의 국적을 알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고급과 저급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값비싼 것이 아무래도 맛이 좋다는 것쯤은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다.
냉면도 그렇다. 육수의 비밀을 알아내기가 몹시 까다롭다. 소고기 양지머리만 삶은 육수인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혼합한 것인지, 야생 꿩고기만을 우려낸 국물인지 도대체 분간이 되질 않는다. 게다가 고기 육수에 동치미 국물을 넣었는지 아닌지도 모를 때가 많다.
그뿐 아니다. 지금도 반으로 자른 삶은 달걀을 맨 처음에 먹어야 하는지, 국물을 마시고 난 뒤에 먹어야 하는지 그걸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 냉면을 가위로 자르면 정말 맛이 없어지는지, 긴 면발을 빨아 당기다가 입안이 만원사례일 때 이로 끊어야 맛이 유지되는지 그것조차 알 길이 없다.
나의 냉면사랑은 '늦게 배운 도둑질'과 같다. 여태까지 먹어본 냉면 중에서 가장 기억이 선명한 곳이 딱 한 곳 있다. 거기는 아무나 갈 수도 없고 더구나 지금은 막혀 있는 곳이다. 바로 북한 금강산 외금강 입구 온정각 뒤쪽 산속에 있는 '금강원'이란 곳이다.
경북대 ROTC 동기생 중에 울산에서 건설업을 하는 친구가 스폰서가 되어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관광 루트 입구에 해당하는 장전항의 부두 공사를 맡아 성공적으로 끝마친 금강산 개발의 주역이었다. 우린 부부 동반 초청이란 특혜 속에 고등학교 국어책에 나오는 정비석의 '산정무한'을 몸으로 읽게 된 것이다.
마지막 날 1인분 30달러짜리인 평양냉면을 먹으러 버스를 타고 금강원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일반 관광객들은 드나들 수 없는 출입금지구역이었다. 금강원은 귀빈초대소였지만 전력 사정이 나빠 천장에 달린 백열전구 몇 개로는 통로가 겨우 보일 정도였다. 이미 식탁에는 인삼주와 들쭉술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반찬들이 세팅되어 있었다.
메인디시 격인 생선회와 질 좋은 진짜 참기름으로 무친 고사리, 취나물 등 나물 접시가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왔다. 술은 무한 리필, 그보다도 기쁨조 출신인 어여쁜 아가씨 서너 명이 '반갑습네다'란 노래를 부른 후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했다. 평소에 술을 못 마시던 친구들도 아가씨가 따라주는 들쭉술 한 잔 받으려고 원샷으로 마시고는 또 잔을 내밀었다.
냉면은 맨 마지막에 나왔다. 친구들 중 반 너머가 취해 있었다. 값비싼 냉면을 술기운이 밀어낸다고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생각해도 금강원 냉면 맛은 무슨 맛인지 기억할 수가 없다. 고명으로 무엇이 얹혔는지, 삶은 달걀 반쪽은 국물 속에 들어 있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겠다. 다시 한 번 가 봐야 할 텐데. 나도 금강산 냉면에 관한 한 실향민이다.
수필가 9hwal@hanmail.net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