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크프루트에 출장을 갔을 때 현지 지사장에게 이끌려 본의 아니게 남녀혼탕에 간 적이 있다.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려 어느 고즈넉한 중소 도시쯤으로 생각되는 곳이었다.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설쯤 되어서야 지사장이 남녀혼탕이라고 설명한다.
증기탕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키보다 긴 타월이 배치되어 있고, 그 타월을 들고 들어가 엉덩이 밑에 놓고 그 위에 발을 얹는다고 했다. 모든 병이 발을 통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가운을 몸 밑에 바치는 것이 오래된 목욕문화라고 했다. 수증기가 자욱한 증기탕에서 동공이 정리되고, 상대방을 알아볼 때 건너편을 보니 게르만족 부부 한 쌍이 앉아 있다. 몸무게가 둘이 합쳐 한 300㎏ 정도 되어 보이는 럭비선수만큼 큰 체격의 부부였다. 여자의 한쪽 가슴이 내 머리통만 한 것 같다. 순간 나는 얼굴이 붉어졌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옆에 같이 온 지사장은 독일 생활에 익숙해서 인지, 아니면 내 무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인지 "좀 늦게 오면 여대생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인들이 여기 오면 하도 쳐다봐서 쳐다보는 사람의 발밑에 와서 반듯이 누워버린다"라고 했다. 가끔 호기심에서 왔다가 친구 부인도 만난단다.
목욕탕은 지하 통로를 통하여 야외 수영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 안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밤하늘의 별들도 볼 수 있다. 별들이 너무나 영롱하다. '독일은 목욕문화가 매우 발달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쩐지 불편하고 불안하다.
다르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기는 하지만 불편하고 불안하기 마련이다. 이주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소통할 수 없는 언어의 장벽, 주변의 다른 풍경들, 시댁에 들어가면 집안의 구조, 다른 식생활, 무엇 하나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누군가 행동으로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면 하루빨리 불안감과 상실감을 털어버리고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경제적 선진국에서 온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지만 피부 색깔이 좀 다르고, 좀 덜 배우고, 후진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태도,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그들의 자녀들, 그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십 년, 이십 년 뒤 미국의 LA 폭동이나, 프랑스 파리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의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리라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가 이주여성에 대하여 인식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규목 시인 gm3419@daegu.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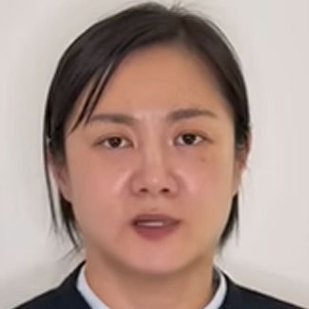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