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것보다 더 나빠.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아는 것과 깨닫는 거에 차이가 있다면 깨닫기 위해서는 아픔이 필요하다는 거야.(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중에서)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제각각 많이 다르다는 것,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토론이나 의견교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인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일수록 그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타인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타인의 생각은 대체로 틀린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판에는 대체로 비난으로 대응했습니다. 비난의 방식도 인신공격이거나 나이를 토대로 한 일방적인 꾸짖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아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깨달으면 반드시 실행하니까요. 세상에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들은 그것 그대로의 실체였고, 그것 그대로의 몸뚱아리였습니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들은 그것 그대로의 권력이었고, 그래서 대체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했습니다.
지식인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주 슬픔을 만들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마음의 거처는 머리(뇌)가 아니라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지성이 아니라 감성이라는 것이지요. 슬픔은 때로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할까요? 대부분 무언가의 부재(不在) 때문에 슬픔이 발생합니다. 대상이 사람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합니다. 슬픔이 극단적인 절망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적인 생존에 대한 욕구로 인해 대체로 슬픔은 분노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재 상황에 대한 분노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의 성숙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대상에 대한 증오로만 나타나면 그 사회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증오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나아가 그것은 특정한 대상을 향하고 있기에 개별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피는 피를 부른다고 표현합니다. 발전적인 분노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 대상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판단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 제도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지식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지식인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지식인이 많습니다. 일본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 곳곳에서 분노가 표출됩니다. 거리마다 구호가 난무하고 화형식까지 이루어집니다. 모 언론사 일본 주재기자가 일본인에게 한국의 현재를 말했습니다. 일본인은 말합니다. 그러다 만다고. 그것이 한국이라고.
그렇습니다. 분노의 표출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언론이 목소리를 냅니다. 문제는 언론에 나오는 수많은 텔레페서(telefessor)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지식인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문제의 본질보다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그에 따라 본질은 멀리 사라지고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한 채 대중들에게 잊혀갑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준희 대구시교육청 장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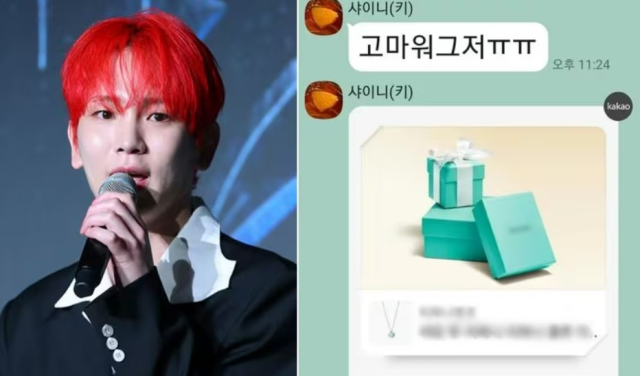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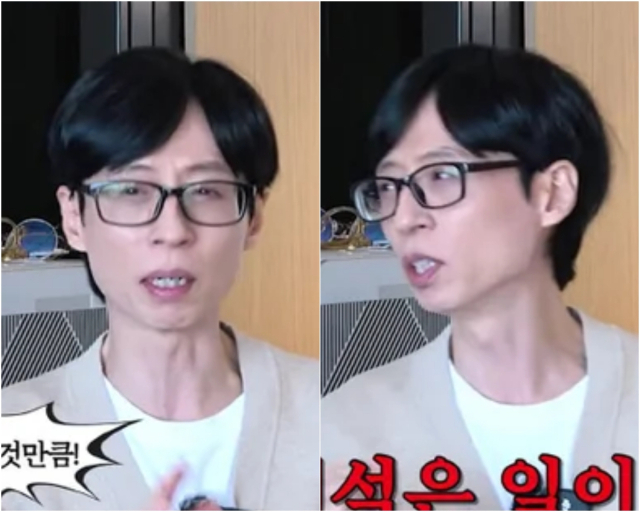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