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이란 날아오는 탄알을 막는 것을 뜻한다. 방탄의 가장 실용화된 양식은 아무래도 방탄조끼와 방탄유리일 것이다. 그런데 군사적으로도 첨단기능이라 할 수 있는 방탄조끼를 조선시대의 군졸들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착용을 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쇄국정책을 펴던 19세기 중후반 조선군은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나 서양제국에 앞서 방탄조끼를 실전에 사용했다.
1866년 병인양요를 겪으면서 서양 총의 성능에 놀란 흥선대원군은 방탄조끼를 개발했는데, 여러 겹의 면을 겹쳐서 단단히 꿰맨 이른바 '면제배갑'(綿製背甲)이었다. 더 놀라운 일은 면제배갑의 방탄 원리가 현대의 최신 방탄조끼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이다.
조선군은 1871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 침몰을 계기로 일어난 신미양요 때 이를 착용했다. 하지만 면제배갑은 실용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착용한 병사들은 한여름 전투에서는 무더위에 시달려야 했으며, 비를 맞거나 강을 건넌 후에는 기동성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불에 극히 취약한 것도 문제였다. 아무튼 방탄조끼를 입은 조선군의 활약에 놀란 미군은 면제배갑을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지금껏 소장하고 있다.
방탄유리는 2장 이상의 유리를 특수한 접합제로 밀착시켜 총탄에도 깨지지 않게 한 강화(强化)유리를 말한다. 플라스틱 박막 유리, 아크릴 플라스틱, 폴리카본 플라스틱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완벽한 방탄유리는 없다. 5m 거리 밖에서 쏜 권총탄 3발 정도는 막아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방탄조끼와 방탄유리라 해도 생명을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최선의 방탄은 총알이 날아오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탄차량을 마다하고 작은 승용차와 KTX를 타고 다니며 수많은 군중과 손을 잡고 소통을 했다. 그러잖아도 세월호 특별법으로 표류하는 정국에 돌출한 '방탄 국회' 논란이 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과 혐오증을 가중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야당 정치인이 노골적인 정치탄압을 받던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인가. 한여름에 면제배갑을 입은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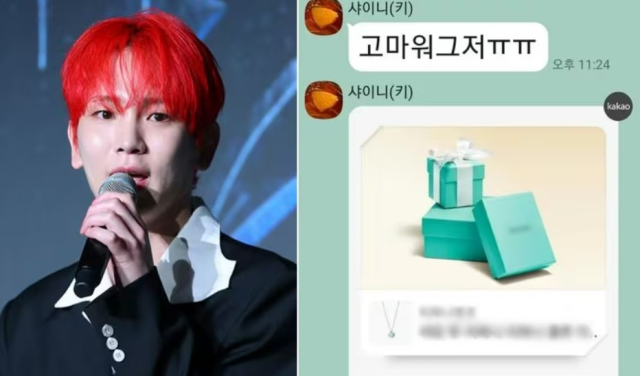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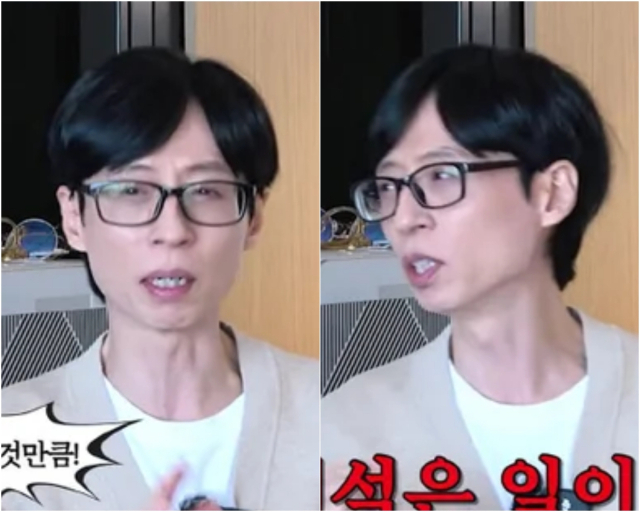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