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둥글어지니 더 밝아 보이는 달빛을 밟으며 올해도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분주하다. 연일 TV 뉴스는 교통 체증에 관심집중을 유발하는 보도를 한다. 사람 냄새가 나는 고향행으로 명절 분위기도 짙은데 홀로 고향으로 못 가는 나는 왜 이리도 지루한 나날인가? 한국에 온 이듬해 추석 휴가에 조상의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애끓음을 다소 접을 수가 있었다. 강릉에는 우리 류씨의 시조가 뿌리의 노래를 시작한 동리가 있다.
중국 고황제 류방의 40세 손인 류전(시호는 문양)이 송조 병부상서로 재직 중 재상인 왕안석의 청묘취식법(익지도 않은 푸른 싹에 세금을 부과)의 부당함을 극간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뜻을 같이한 팔학사의 일원으로 고려 문종 36년에 고려에 동도하게 된 것이 한국의 도시조이다.
그의 증손인 류창이 조선 개국 2등 공신으로 강릉 옥계에 부원군으로 봉해지며 후손들이 본관을 강릉으로 하게 되었다. 그 공의 묘소는 기록에 남아있으나 찾을 길 없어 그가 태어난 옥계면 현내리에 강릉 류씨 종친회가 사당을 세우게 되었다.
현내리는 여느 마을과 다를 바 없는 동리였다. 남으로는 햇빛을 받으며 풍년을 앞둔 바둑판 같은 황금 이삭들이 미풍에 하느작이고 북으로는 푸른 녹음이 짙은 산기슭을 향해 몇십 호의 농호가 옹기종기 모여앉아 있는 형국이었다. 동리 기슭 가장자리에는 옛 팔간 집 하나가 기와를 떠이고 있어 조상의 땅을 딛고 선 신빙성을 가해주었다. 어쩌면 혹시 한복을 입은 우리 핏줄이 기거하고 있는 듯 문을 벌컥 열었다. 그러나 조상이나 후손의 집은 아니었다. 몇백여 년의 시대를 거쳐서 우리의 류씨 종친들이 상흔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것이 큰 섭섭함으로 다가왔다.
마을 뒤에는 장지가 있었다. 우계(옥계의 옛 지명) 이씨의 장황한 비석이 세워져 있는 묘지가 보이는 가운데 여러 집을 방문해서야 공동묘지의 골짜기를 경계로 하고 좌측에 세워져 홀로 서 있는 우리 시조의 사당을 찾았다. 마른 잡풀이 다문다문한 마당의 거북 등에 세워진 유적비를 쳐다보는 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날 것처럼 왠지 쓸쓸하기만 했다. 안동시 하회마을에는 백여 호나 되는 동리에 풍산 류씨 가족들이 거의 70%나 모여 살고 있다. 현내리도 장지가 있던 자리면 꽤 큰 마을이었을 법한데 우리 후손들은 고향땅을 지키지 않고 다 어디로 훌훌 떠나버렸을까. 그대로 만감이 교차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견고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 가족 같은 후손들은 저만큼 유배를 떠난 살림처럼 정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방황하며 절박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마음이 괜스레 지지리도 비틀렸다.
나는 어찌하여 중국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했을까? 할아버지는 삶을 지탱하기 위해 남매 넷을 데리고 남에서 북으로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섰다고 한다. "별거 없다. 우리 가족의 근면했던 근본이 바로 가보니라." 가훈처럼 큰아버지가 끌끌 혀가 입천장에 닿는 소리를 내시면서 말씀하던 목소리의 울림이 유장하다. 그리고 파란만장했던 우리 뿌리둘레는 오늘까지 퍼져 나갔다.
시조의 사당 앞에서 나는 오래도록 허리를 꺾은 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내 자식에게 전하고 그 후손들에게 수신해야 할 숙업을 느낄수록 스스로 감개했다.
시조의 비는 낯설었지만 이내 넉넉해졌다. 늦게나마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눅눅한 주위 안개가 솜이불처럼 푸근해졌다. 시조의 이야기와 역사가 있는 대의 이야기를 가늠해내고 국경을 넘어 찾아보았다는 사명감에 다소 안도한다.
땅의 시작과 하늘의 끝을 보지 마라. 내가 선 자리는 강릉 류씨의 땅, 뿌리를 보았다.
류일복(중국동포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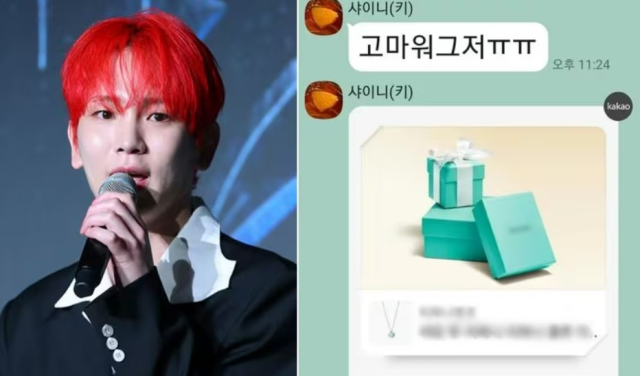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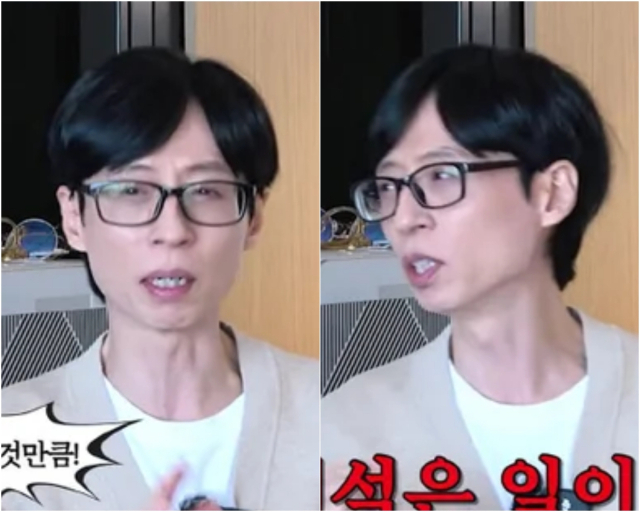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