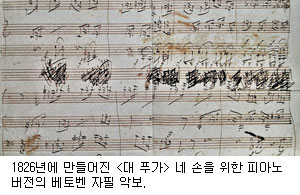
베토벤을 모델로 한 소설 '장 크리스토프'를 쓴 로맹 롤랑은 "만약 하나님이 인류에게 범한 죄가 있다면 그것은 베토벤의 귀를 앗아간 것"이라고 했다. 롤랑과 당사자인 베토벤에게는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필자는 생각을 달리한다. "나는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화가 고갱이 이같이 말했던가. 그게 무슨 말인가 싶다가도 두 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게 되는 그 말, 비록 세상 소리 듣는 것에는 어두운 베토벤이지만 그렇기에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었다. 그는 옆집 사람이 두드리는 노크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운명은 어떻게 노크하는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운명 교향곡은 그렇게 탄생하지 않았던가.
다시 영화로 돌아가자. 초연이 안나 훌츠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끝나고 이윽고 현악4중주 (Grosse Fuge)를 발표한다. 네 대의 현악기가 사정없이 활을 내지르며 긁는 소리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망하여 공연 중 자리를 떠난다. 심지어 대주교는 떠나면서 혹평까지 한다. "귀가 이토록 나빠진 줄은 몰랐어."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안나 훌츠 혼자였다. 그러나 그녀도 대주교와 같은 심정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베토벤은 이야기한다. "추하지만 아름답지. 미에 대한 도전이야. 추함과 본능으로 음악을 인도하지. 이 안의 창자가 신께 가는 길이야. (배를 잡으며) 신은 여기 살아. 머리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야. 신을 느끼는 건 이 창자 속이야. 천국을 향해 창자가 휘감겨 있는 거야."
직설적이고 다소 천박한 언어 선택은 거리에 주정뱅이나 할 법한 그런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곱씹어보면 이 안에는 분명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미학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처한 주변이 아름답지 않은데 대변하는 예술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부조리와 차별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아름다워야 예술'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베토벤은 보기 좋게 깨부순다. 미화, 주변을 아름답게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왜곡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보려 했던 베토벤이야말로 당시 세상에 필요한 소리를 들었으며, 는 번민에 이은 통찰에서 나온 것이다.
"신을 느끼는 건 이 창자 속이야." 신체에서 제일 깊숙이 자리 잡은 창자 속은 어지럽고 어두운 베토벤의 실상을 은유한다. 말구유 안에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그 길 또한 진달래꽃 고이 뿌려진 꽃길보다 냄새 나는 창자 속이었다. 그 창자 속에서 베토벤의 예술적 혼이 나왔으며 예수의 다시 없을 아가페 사랑도 그 속에서 나왔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애달프다'라는 말에서 '애'는 실제로 창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말은 창자가 닳을 만큼의 아픔을 뜻하는데 애달팠던 베토벤의 간증이 인 셈이다.
바야흐로 가을 국화가 만발한 요즘이다. 찬 서리를 맞아야만 품고 있던 향내를 드러낸다고 하는 가을 국화처럼 들리지 않는 아픔 그 창자 같은 현실 속에서 아픔을 경험한 베토벤, 그의 아픔은 아름이 되어 진한 향기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다. (다음 회에 계속)
이예진(공연기획가)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